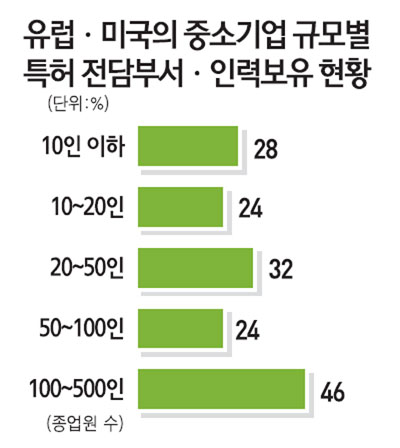|
한국이 수출을 늘리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모방과 짜깁기로 일단 제품부터 팔고 보자는 후진국형 패러다임에서 특허로 기술을 보호받은 제품만 파는 선진국형 패러다임으로의 변화가 요구된다. 독일 에네르콘사는 지난 1984년에 창립해 기술개발에 집중했다. 10여년 만에 세계 풍력터빈 발전특허의 40%를 확보했다. 지멘스 등 대기업들도 풍력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에네르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의 다케나카제작소는 볼트ㆍ너트를 만드는데 주문이 폭주해 국내외 대기업에 하청을 줬다. 일본의 미라이공업은 전기설비자재 특허로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이처럼 규모는 작지만 기술력이나 시장지배력에서 대기업을 능가하는 중소ㆍ중견기업들이 많다. 작지만 자신만의 한 우물을 파고 특허로 잘 보호하면 세계시장을 지배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국내 중소기업들은 자금난과 인력 부족,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기술개발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그러나 선진국 강소기업처럼 특허에 대한 마인드를 바꿔 시장조사와 함께 선행 기술을 분석하고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특화기술을 개발한다면 부족한 인력과 인프라로도 지식재산 강소기업이 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2005년 특허를 많이 출원한 기업 50곳 중 중소기업이 12곳이나 됐다. 또 대기업은 직원 1,000명당 5.8건의 특허를 신청했지만 지식재산 강소기업은 5배나 많은 30.6건을 신청했다. 일본 중소기업도 제품 하나당 평균 5건 이상의 특허로 무장한다. 반면 한국은 특허출원 상위 50위 기업이 모두 대기업이다. 중소ㆍ중견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2000년 대기업 한 곳당 특허출원 건수는 66.1건으로 중소기업의 2.05건보다 32배 많았다. 대기업들은 점차 특허를 늘려가 2005년에는 회사당 93.8건으로 증가했지만 중소기업은 2.24건으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쳐 편차가 42배로 벌어졌다. 매출이 늘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커져도 특허 마인드는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업의 매출이 1,000억원을 넘어서면 원천기술을 가진 해외 기업의 특허공격 대상이 된다. 몇 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던 상품이 특허분쟁에 휘말리게 되고 기업의 생존이 위협받게 된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특허는 분쟁을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라며 "대기업ㆍ중소기업을 막론하고 공격ㆍ방어용 특허를 확보하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특허 암초에 부닥쳐 좌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영욱 하합동특허법률사무소 소장은 "기업이 기술과 특허 없이 제품을 만드는 것은 기초공사 없이 건물을 올리는 것과 같다"며 "특허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적극 나서 교육을 하는 한편 기업들은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특허침해를 방지하고 특허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