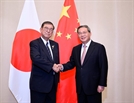<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해외칼럼] 기로에 선 美금융산업
입력2002-07-22 00:00:00
수정
2002.07.22 00:00:00
미국이 전환점에 놓여 있다.기업의 비리 스캔들에다 증시폭락의 상황에 직면한 미 정부는 기업에서 난무하고 있는 온갖 부정에 대처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재계를 향한 미 국민의 태도가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정치가들이 예견했던 것보다 훨씬 큰 것이다. 이제 지난 90년대 후반에 만끽했던 버블이 꺼져가고 있다는 것이 시장에서 보다 명확해지고 있다.
2000년 3월 이후의 경기하강 국면이 이보다 꼭 3년 전의 경기상승 국면과 정반대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19세기 후반 미국의 대호황 시대와 광란의 20년대에는 사회 곳곳에서 부(富)가 넘쳐났다.
부자들이 돈을 퍼부어 이룬 금융시스템과 기술의 변혁은 새로운 벼락경기를 조성했다. 하지만 이 같은 벼락경기는 증시폭락으로 힘을 잃게 됐다.
현재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80년대와 90년대 미국사회의 금융화는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버블이 정점에 이르게 되자 경제이론에 근거한 경고는 무시됐다.
금융시장에서는 각종 부조리가 판치게 됐으며 윤리는 탐욕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됐다. 이 같은 상황에 미 국민들의 불만은 개혁을 향한 목소리로 전환됐다. 시장의 부정과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한 새로운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하지만 개혁작업은 힘들다. 버블은 금융ㆍ정치ㆍ철학 등 3중의 부패를 낳았기 때문이다. 온갖 사기와 부정은 투기붐과 함께 행동했다.
역사가들은 시장의 광기가 커질 때 막대한 규모의 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을 역사 속에서 일관되게 확인시켜주고 있다.
투기적인 성격의 시장과 급조된 부의 축적은 철학과 이데올로기를 부패에 찌들게 했으며 결국 무자비한 탐욕의 노예로 만들었다.
80년대와 90년대는 19세기 대호황의 시기를 모방했는데 시장숭배가 과도한 자유방임주의를 만들었다. 공공의 선과 공정함은 시민들의 논의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런 시점에서 과연 버블의 한계가 어디쯤일까 하는 의문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지난 수십년간 미국은 소위 금융화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시스템 자체가 변했다.
자금이동, 주식운용, 자산의 증권화, 파생상품 거래 등이 제조와 물류 등을 대신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변혁은 그 바탕에 많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80년대 금융산업이 새롭게 부상했을 때는 각종 금융규제가 철폐됐고 금융기관은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냈다.
증시가 상승세를 타자 은행예금에서 빠져나간 돈은 뮤추얼펀드 등으로 유입돼 증권업이 알짜 수익을 남기는 산업이 됐다.
컴퓨터는 파생금융 상품의 거래를 수월하게 만들어 트레이더들이 주사위를 가지고 노름을 하는 것처럼 미 국채와 유로 본드 등의 상품을 시간ㆍ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하게끔 했다.
여러 어리석은 정책과 시장의 힘이 다른 산업들을 끌어내리는 동안 금융ㆍ보험ㆍ부동산 부문이 제조업 부문을 압도하기 시작했으며 95년부터 국민총생산(GDP)을 앞에서 이끌기 시작했다. 2000년까지 이런 부문은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각종 선거 때는 가장 많은 기부금을 냈으며 워싱턴 정가의 로비에 있어서도 가장 많은 돈을 소요했다.
지난 20년여 동안 저축에서 뮤추얼펀드로 이동한 돈은 증시와 돈의 문화를 부양시켰다. 기업 임원은 스톡옵션과 각종 보상체계에만 몰두하게 됐다. 주요 기업들은 선물거래, 주식투자, 연기금 유용 등 각종 편법을 통해 이익을 부풀렸다. 엔론 사례는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가계경제를 지키기 위해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국민적인 논의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의 이 같은 제안이 논의를 위한 정지작업이 될 것인지 단지 보이기 위한 장식에 불과할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
(뉴욕타임스 신디케이트=뉴시스)
/케빈 필립스(컬럼니스트)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