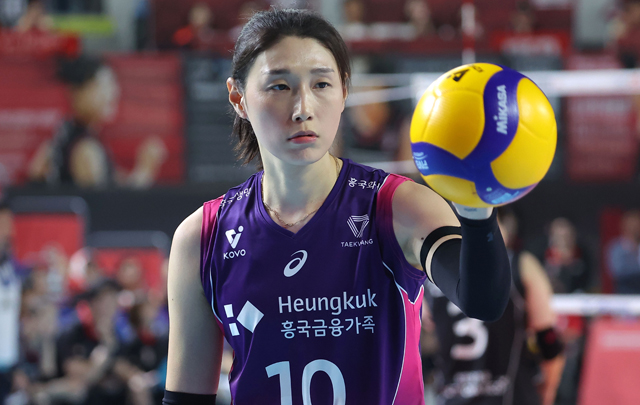선비는 그만 넋을 놓고 말았다. 신록이 짙어가고 뭇꽃들은 피어나는데 더 지체했다간 늦봄마저 다 가버릴 기세니 말이다. 머슴아이를 시켜 말을 내오게 한 젊은 선비는 화창한 날씨를 따라 길을 나섰다. 버드나무 앞에서 암수 꾀꼬리 한 쌍이 화답(和答)하며 노니는 것을 마주한 그는 멍하니 정신을 빼앗기고 말았다. ‘말 위에서 꾀꼬리가 우는 것을 바라본다’는 이 ‘마상청앵’은 단원 김홍도의 작품이다. 멍한 선비와 그를 쳐다보는 장난기 가득한 머슴의 표정이 영락없는 ‘단원 화풍’의 인물이지만 잘 알려진 ‘단원풍속화첩’의 작품들보다 묘사가 더 정교하다. 단원 특유의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철선묘(鐵線描) 기법은 조선옷이 가지는 넉넉하면서도 빳빳한 옷맵시를 탁월하게 표현해 사각거리는 옷자락을 움켜쥘 수 있을 듯하다. 반면 말은 윤곽선 없는 몰골법으로, 풀들 또한 먹의 번짐만으로 그려 사람과 자연이 대조를 이루는 동시에 조화롭다. 대담한 구도로 버드나무는 길섶 한쪽으로 몰아 간결하게 처리했고 선비 일행을 큰길 가운데 세워 돋보이게 했다. 꾀꼬리 위쪽으로 넓게 하늘을 비워둔 것도 인상적이다. 이 그림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한창인 간송문화전 6부 전시 ‘풍속인물화-일상,꿈 그리고 풍류’에서 직접 볼 수 있다. 8월28일까지.
/조상인기자 ccs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csi@sedaily.com
ccs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