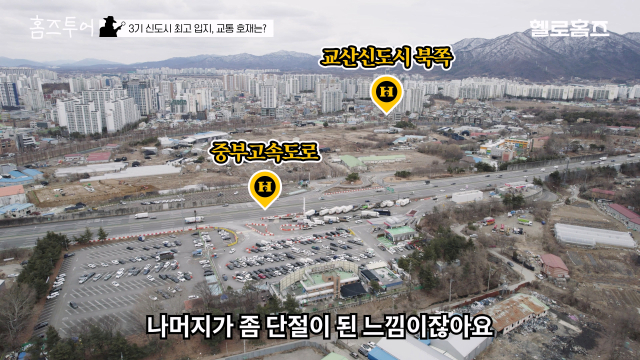보건복지부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산후조리원 2주간 이용요금(신생아 1명 기준)’을 보면 H산후조리원의 일반실(800만원)은 전북 정읍시 H산후조리원(70만원)의 11.4배, 특실(2,000만원)은 28.6배를 받았다.
특실 요금이 500만~1,000만원인 23개 조리원 중 17곳은 서울에, 6곳은 부산 해운대구, 경기 고양·성남·용인시, 대전 서구에 있었다.
서울 강남구의 산후조리원 일반실 요금은 350만~800만원으로 모두 서울지역 평균(302만원)을 웃돌았다. 반면 강동·강서·노원·송파·영등포·은평구에는 150만~170만원대도 있었다.
100만원 이하 산후조리원은 전국에 7곳(경기 양평 1, 경남 창원·통영 각 2, 전북 전주·정읍 각 1)이었다. 전국 평균 이용요금은 일반실이 230만원, 특실 298만원이었다.
시도별 평균 요금은 서울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일반실은 서울(302만원)이 2위 울산(241만원)보다 25% 비쌌고 대전·경기·충남·대구 230만~202만원, 강원·인천·충북·부산·광주 195만~182만원, 경북·제주·전남·경남·전북 179만~154만원이었다. 특실은 서울(439만원)이 2위 대전(292만원)보다 50% 비쌌고 부산·울산·경기는 283만~280만원, 대구·충남·광주·충북·인천·강원은 249만~228만원, 경북·전남·경남·제주·전북 205만~195만원이었다.
남 의원은 “2주간 산후조리원 일반실 이용요금이 70만~2,000만원으로 천차만별인데 요금을 알아보려면 산후조리원에 전화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이용요금, 감염병 발병 및 시설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또 “공공 산후조리원 4곳(서울 송파, 제주 서귀포, 충남 홍성, 전남 해남)의 평균 이용요금이 170만원(특실 없음)으로 민간에 비해 저렴해 입소 대기자가 넘치고 있지만 모자보건법령의 기준 때문에 출생아가 적은 농어촌지역 23개 시·군만 설치할 수 있을 뿐”이라며 설치요건 완화를 주장했다.
저출산 추세에도 전국 산후조리원 수는 2012년말 478곳에서 612곳으로 28% 늘어났다. 반면 산후조리원의 위생관리 등은 미흡했다.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자보건법·식품위생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480건이 적발됐다.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신생아나 산모가 감염병에 걸린 사례도 804건이나 됐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