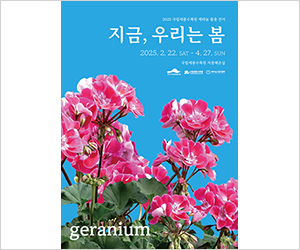축 늘어진 젖가슴을 가까스로 쓸어담은 속옷 차림의 세 여인이 앉아있다. 20세기 초 독일 바이마르공화국 시절에 흔히 볼 수 있었던 베를린 유흥가의 창녀들이다. 활력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노파는 어깨끈이 흘러내린 것에도 아랑곳 않고, 반벌거숭이 늙은 창녀는 야하기는커녕 측은하며, 당시 유럽에서 인기였던 일본 가부키식 화장도 패인 주름을 가리지 못한다. 시선을 압도하는 것은 화면 중앙을 차지한 어린 소녀다. 소녀의 눈빛은 당당하다 못해 오만하다. 사창가에 눌러앉은 여인들과는 달리 어린 소녀는 당장에라도 계단을 걸어올라 이 어둠을 뚫고 나갈 수 있다. 늙음과 젊음 뿐 아니라 절망과 희망이 그들 사이를 가른다. 네덜란드 출신의 세계적 사진작가 어윈 올라프(57)의 ‘베를린’ 연작 중 하나다. 테이블 앞에 한 줄로 앉은 매춘부의 모습은 독일 화가 오토 딕스의 1921년작 ‘살롱’에서 착안한 것이 분명하다. 구도와 소재를 고전에서 착안한 작가는 원작에 없는 희망을 더했다.
청와대 바로 옆 공근혜갤러리에서 그의 개인전 ‘베를린,웨이팅 & 로얄 블러드’가 다음 달 11일까지 열린다. 전시를 위해 내한한 작가는 ‘베를린’ 시리즈에 대해 “스페인 여행 중 공항에서 본 아이들은 부모의 통제하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위에 군림하고 있었다”면서 “이런 아이들이 만약 어른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상상으로 작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철없는 아이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욕망에 충실하며 더 가혹하다. 히틀러를 연상하게 하는 양복 차림에 가죽장갑을 낀 소년이 의자에 앉아 거만하게 쏘아보는 사진 앞에서는 어른도 위축될 정도다. 소재도 탁월하지만 렘브란트와 베르메르의 계보를 있는 네덜란드 거장답게 화면 구성의 감각이 뛰어나다.
올라프가 국내에 알려진 것은 폭력에 의해 처참하게 생을 마감한 왕족을 주인공으로 한 2000년작 ‘로얄 블러드’ 시리즈가 계기였다. 로마의 지배자가 됐으나 공화정 옹호파의 칼에 찔려 죽은 줄리어스 시저, 제정 러시아 말기 비선실세였던 수도사 라스푸틴의 후원자로 러시아혁명 때 총살당한 알렉산드라 황후, 프랑스혁명 당시 단두대에서 목이 잘린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의 등 연작이 나란히 걸렸다. 왕족의 고결함을 상징하는 진주색 옷과 뽀얀 살결 위로 흐르는 붉은 피가 처연하면서도 아름답다.
작가가 등장하는 자화상도 있다. 베를린 올림픽경기장의 높은 계단을 오르는 남자의 뒷모습. 폐기종을 앓고 있어 한걸음 떼어 올리기가 무척 힘들었던 작가는 히틀러의 전용계단이던 이 역사의 뒤안길에서 희망과 용기를 찾아냈다고 한다. 조급해하는 현대인에게 기다림의 가치를 일깨우는 작가의 최신작 ‘웨이팅’도 영상 설치작품과 함께 이번 전시에 선보였다. (02)738-7776
/조상인기자 ccs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csi@sedaily.com
ccs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