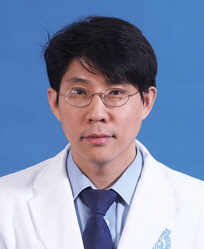태아가 유전성 난청인지 여부를 임신 7~10주께부터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법이 나왔다.
최병윤 분당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팀이 개발한 이 검사법은 산모의 말초혈액 속에 극소량 존재하는 태아의 DNA를 대량으로 증폭(복제)해 100여개의 난청 관련 유전자에 미세한 점돌연변이(Point Mutation)가 일어났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초미세 DNA 증폭분석(Picodroplet PCR) 기술을 접목한 새 검사법은 임신 7~10주께부터 검사할 수 있고 해상도가 뛰어나 염색체 수 이상과 같은 큰 문제는 물론 유전자 염기서열 중 1개의 염기가 바뀌어 생기는 점돌연변이까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
최 교수는 새 검사법의 장점에 대해 “태아의 난청 여부를 임신 중 미리 파악해 산모와 가족의 불필요한 걱정을 덜고 태아가 난청으로 진단되면 출생 후 조기에 청각재활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싼 게 흠이다. 제작비용이 60만~70만원 들기 때문에 80만~100만원가량인 검사비 전액을 본인 부담해야 한다.
현재 태아의 유전질환 위험에 대한 검사는 바늘 등으로 자궁 태반 내 융모막 조직이나 양수, 산모의 혈액을 채취해 염색체의 수·형태 이상이나 유전자의 돌연변이 여부를 검사한다. 하지만 융모막·양수 검사는 임신 9~18주쯤 돼야 할 수 있고 태아에 손상을 입히거나 유산을 일으킬 수 있다.
산모의 혈액을 이용하는 대용량 염기서열분석법(NGS), 유전자칩 등을 활용한 기존 검사법도 한계가 있다. NGS는 엄청난 수의 유전자 변이 부위를 모두 들여다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분석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유전자칩 등을 활용한 중합효소연쇄반응(PCR) 검사는 미량의 DNA 시료에서 특정 영역의 DNA를 수시간 만에 수십만배로 증폭할 수 있지만 정확도가 떨어져 염색체 수 이상을 보이는 다운증후군같이 비교적 판단이 쉬운 일부 유전질환 검사에 쓰이고 있다.
최 교수의 연구 결과는 국제저널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에 게재됐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