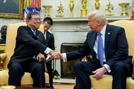17일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008년 조준웅 특별검사 때와는 달리 이번 박영수 특검의 칼날은 피해가지 못했다. ‘삼성 특검’으로 불렸던 조준웅 특검 때는 구속 위기를 넘겼지만 ‘최순실 특검’에서 발목이 잡혔다.
이 부회장은 2008년 조준웅 특검 때 이건희-이재용 부자 간 경영권 불법승계를 둘러싼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특검보 3명, 파견검사 3명 등 91명 규모로 꾸려졌던 조준웅 특검은 ‘삼성 특검’으로 불리며 삼성의 승계 부정 의혹을 파헤쳤다.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은 당시 모든 의혹에서 벗어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99일간 진행된 수사에서 이 부회장은 한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대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두 차례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대부분 혐의를 떠안았다.
당시 쟁점 의혹은 삼성그룹 순환출자 고리의 핵심인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이 회장이 아들인 이 부회장에게 헐값으로 넘겨 경영권 양도를 추진했다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에버랜드에 최소 969억원의 손해를 안긴 혐의(배임)와 4조5,000억원대 자금 은닉 및 양도소득세 1,128억원 포탈 혐의(조세포탈 및 증권거래법 위반) 등이 불거졌다.
조준웅 특검은 당시 이 회장이 일련의 작업을 주도했다고 보고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회장은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 부회장은 무혐의 처분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결국 이 부회장은 본인이 총수가 된 상황에서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5시35분께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in@sedaily.com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