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대의 자전거를 반으로 잘라 하나는 앞바퀴끼리, 나머지는 뒷바퀴끼리 이어 붙였다. 안장이 놓인 뒷바퀴가 맞붙은 자전거는 나아갈 방향도 동력도 잃은 채 그저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꼴이 됐다. 의자 노릇이라도 하기에는 불편하기 짝이 없다. 운전대가 달린 앞바퀴를 맞댄 자전거는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하고 휘청인다. 전진할 기세로 앞을 바라보지만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신세다. 외발자전거보다 더 위태로운 두발자전거다. 개념미술가인 중견작가 안규철 한예종 교수가 지난주 개막한 국제갤러리 개인전에 내놓은 설치작품 ‘두 대의 자전거’다.
100m도 안 떨어진 인근 갤러리아라리오에서는 젊은 작가 백현주가 아예 ‘낭패’라는 제목으로 개인전을 열었다. 중국 고사에 등장하는 상상 속 동물인 ‘낭(狼)’은 앞다리만 있는 이리, ‘패(狽)’는 뒷다리만 있는 이리다. 낭은 포악하면서 꾀가 부족하고 패는 온순하고 영민해 극단적으로 ‘다른’ 성격이지만 홀로 설 수 없기에 서로를 의지하고 때로는 이용하며 살아간다. 이 둘이 뜻이 맞지 않아 떨어져 버린,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을 우리는 ‘낭패를 봤다’고 말한다. 작가는 다리가 모자란 의자와 탁자 등을 서로 교묘하게 기대게 해 천장까지 쌓은 다음 와르르 무너뜨렸다. 말 그대로 낭패를 본 전시다.
그러나 진짜 ‘낭패’는 전시장 밖에 있다. 이들 전시가 열리는 삼청로를 따라 율곡로 방면으로 내려가면 오른쪽은 광화문역, 왼쪽은 안국역이다. ‘탄핵 정국’에서 매주 토요일이면 광화문 쪽에서 촛불이 타올랐고 안국역 쪽에서는 태극기가 휘날려 시린 겨울밤을 동동 구르게 했다. 팽팽하게 맞선 양쪽 세력은 각자의 목소리를 드높인다. 누구도 결코 뜻을 굽히지 않으며 그럴 생각도 없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다가올수록 시위는 더욱 달아올랐고 광화문에서 안국역 방향으로의 촛불 행진, 덕수궁 대한문 앞의 태극기 집회 등으로 확장됐다. ‘질서 있는 집회’의 놀라운 사례로 외신이 극찬한 평화적 집회는 퇴색하고 최근에는 폭력과 폭언이 난무한다. 이들 중 한쪽만이 남은 세상이 과연 ‘바라던 바른 사회’이려나. 어느 한쪽이 발언권을 장악해 다른 쪽의 입을 다물게 하는 것이 과연 평화를 불러올까. ‘같은 쪽’만 남은 사회는 이내 ‘정체’에 빠지고 만다. 마치 뒷바퀴만 있는, 혹은 앞바퀴만 있는 자전거처럼 말이다. 이른바 보수와 진보의 균형은 가운데 지점의 평균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발전적 공존을 의미한다.
일찍이 예술은 종교와 정치의 신하였고 금권의 전유물이었다. 계몽주의와 혁명 이후 ‘예술을 위한 예술’의 순수성을 주장하는 낭만주의가 성행했지만 잠시였다. 사회와 분리된 순수함 자체의 예술은 드물다. 독립권을 얻어낸 예술은 시대의 자화상이 됐고 때로는 미래를 예언한다. 낭패를 극복하고 힘찬 균형감으로 다시 자전거를 굴릴 때라고, 예술이 먼저 말하고 있다.
/ ccs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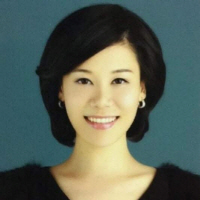

 ccsi@sedaily.com
ccsi@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