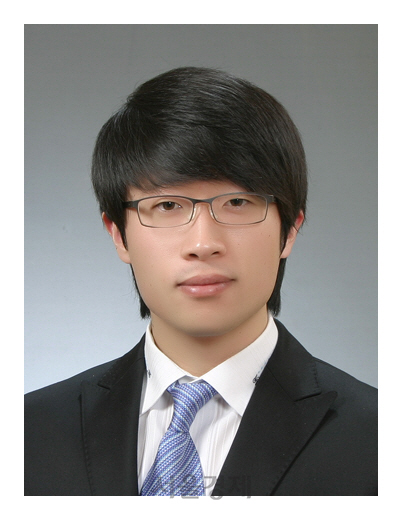금호타이어 매각 작업을 두고 KDB산업은행과 금호그룹 간 커져만 가는 갈등을 보면 지난해 한진해운의 구조조정 과정이 묘하게 오버랩 된다. 한 기업은(금호타이어) 구조조정 작업을 마치고 주인을 찾는 과정이고 다른 한 기업(한진해운)은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생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보면 간극이 크다. 그러나 채권단과 사주의 행태, 그 내면은 속속들이 닮았다.
우선 소통의 부재다. 금호그룹은 쟁점인 우선매수청구권의 인정 범위에 대해 채권단에 안건으로 부의해 결정해달라고 산은 측에 요청했다. 그러나 산은은 묵묵부답이다. 지난 2010년 체결한 약정서상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원칙만 되풀이한다. 특히 언론이 전달 창구인 방식이 문제다. 시계를 지난해 7~8월로 돌려보자. 한진그룹과 산은 역시 각자 언론을 통해 힘 겨루기를 했다. 시간이 갈수록 양측 간 신뢰는 추락했다.
산은에서 보면 선뜻 나서기가 부담스러운 점도 같다. 두 케이스 모두 특정 기업에 대한 혜택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온 게 한진해운 구조조정에서는 ‘선 용선료·사채권자 협상’, 금호타이어 매각에서는 ‘선자본조달계획 제출’이다. 한진해운은 “채권단에서 지원해서 살린다는 시그널이 있어야 용선주들도 동참한다”고 항변했고 금호그룹은 “세상에 사전 확약 없이 들어올 수 있는 전략적투자자(SI)들이 어디 있느냐”고 맞선다.
공통점을 되짚어보면 우려가 커진다. 극한의 갈등으로 타협점 근처에도 가지 못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버린 한진해운의 전례를 밟을 가능성 때문이다. 물론 한진해운에 채권단이 막대한 자금을 넣어 한진해운을 살리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었다는 보장은 없다. 금호타이어 역시 더블스타가 아닌 금호그룹이 품는 것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다만 당사자 간에 치열한 갈등으로 타협점을 찾아가려는 노력조차 하지 못한 우(愚)는 범하면 안 된다. 따져보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만한 것도 아니다. 산은과 금호그룹 모두 자존심을 내려놓고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시한은 30일도 채 안 남았다.
cmk2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