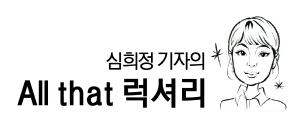“더 새로운 것 없어?”
‘명품’하면 독보적인 ‘에르메스’와 ‘샤넬’은 알게 모르게 가격을 올리면서 갈수록 멀어지는 가운데 이미 이름난 럭셔리 브랜드에 식상함을 느낀 나머지 갈증을 채워줄 새로운 명품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고품질, 클래식, 스토리, 역사, 장신정신 등 명품의 조건은 갖췄으면서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아 ‘아는 사람만 아는 명품’, 일명 ‘뉴클래식 럭셔리’가 명품의 새로운 주자로 떠올랐다. 명품 ‘제4의 물결’이 시작된 것이다. 뉴클래식 명품은 클래식과 엣지, 희소성 3박자가 갖춰진 ‘틈새 럭셔리’로 명품의 새로운 계보를 형성하고 있다.
로에베 관계자는 “뉴럭셔리는 기존 명품이라고 부르는 브랜드에 식상한 소비자들이 대중이 쉽게 알아보지 못하면서도 아는 사람끼리만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며 “이는 소비자들이 브랜드의 ‘이름’이 아니라 ‘가치’를 좇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명품 계보 1차는 원조 럭셔리다.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구찌,프라다, 펜디, 셀린 등이 그 주인공. 2차는 트렌디 럭셔리로 고야드, 생로랑, 지방시, 발렌시아가, 발렌티노 등이며 3차는 컨템포러리 디자이너 명품으로 스텔라 매카트니, 프로엔자스쿨러, 바오바오백 등이 해당된다.이 뒤를 이어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 뉴클래식 럭셔리의 대표 주자는 모이나, 로에베, 델보, 발렉스트라 등이다.
이 가운데 모이나는 1849년에 파리에서 론칭해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트렁크 가방을 만드는 브랜드다. 베르나르 아르노 LVMH 회장이 최근 가장 주목하는 떠오른 샛별로 2011년 LVMH 그룹이 인수해 전 세계로 확장 중이다. 국내에는 서울신라호텔과 신세계백화점(강남점)에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입점해 럭셔리한 이미지를 전개하고 있다. 매장이 2곳에 불과하지만 패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선 ‘갖고 싶은 백’의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디자인이 상당히 심플하지만 유려한 선이 고급스럽고 어디에도 로고가 박혀 있지 않다. 주력 제품은 ‘레잔’과 ‘파라디’로 가격은 500만~700만 원대이며 최고가는 5,000만원까지 올라간다. 베스트아이템 레잔의 경우 핑크와 같은 희귀 컬러는 매장에 나오는 즉시 금새 팔려나가 몇 개월씩 기다려야 할 정도.
‘벨기에의 에르메스’로 알려진 ‘델보’는 일찌감치 신흥 청담백으로 통한다. 무겁고 클래식해 자칫 올드해 보일 수 있는 에르메스보다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으면서도 클래식하지만 발랄하고 젊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고급과 엣지’를 한꺼번에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평가다.
아무 장식 없이 정교한 봉제만으로 완성된 정갈하고 담백함을 어필하는 100% 수공예 가죽 전문 ‘발렉스트라’는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가치를 드러내는 네오 클래식의 대표성을 띤다. 이 브랜드 역시 아무리 살펴봐도 로고를 찾아볼 수 없으며 군더더기는 없지만 그렇다고 심심하지 않은 것이 트렌디하며 전문직 일명 ‘크리에이티브 클래스’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 있다.
지난해 코오롱FnC에서 전개하기 시작한 로에베는 지난해 코오롱의 품에 안기면서 재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스페인의 에르메스’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로에베는 150년 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지만 영하고 캐주얼하면서도 정반대의 고풍스러운 이미지까지 갖춰 패피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이들이 주목받는 공통적인 이유는 유행에 워낙 민감한 소비자들이 이미 너무 잘 알려진 명품 브랜드에 지친 나머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는 데 있다. ‘프라다·구찌’라서 갖고 싶은 게 아니라 제품의 가치 평가에 따라 지갑을 여는 소비자들이 늘었다. 에르메스나 샤넬이 조금씩 가격을 올리면서 갈수록 손에 닿을 수 없는 ‘넘사벽’이 되어가는 마당에 정형화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명품의 품격은 갖춘 색다른 브랜드로 차별화를 추구하고 경향이 짙기 때문이다.
백화점 명품관 관계자는 “숨은 명품을 발굴하는 소비자들이 생겨나면서 원조 럭셔리 브랜드들도 색다른 감성을 입히기 위해 스트리트 브랜드와도 손잡는 등 지속적인 컬래버레이션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희정기자 yvett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