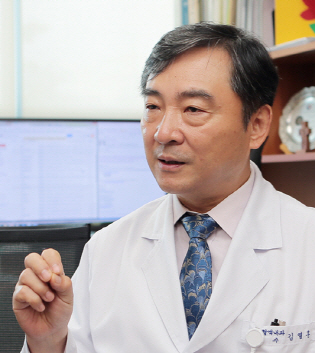최근 보건복지부가 신설한 ‘정밀의료기반 암진단·치료법 개발사업단’의 단장으로 선임된 김열홍(사진) 고려대 안암병원 교수(종양혈액내과)는 9일 인터뷰에서 사업추진 방향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그는 “사업단이 중심이 돼 주요 병원·종양내과 의사, 국내외 제약회사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국 단위의 임상시험을 설계·관리할 계획”이라며 “임상 결과를 취합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에 항암제의 적응증 확대 및 판매허가, 신의료기술 인정 신청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업단을 꾸린 이유는 수술을 할 수 없거나 기존 표준요법이 듣지 않는 암환자에게 차세대 항암 요법인 유전자 맞춤형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임상시험인 만큼 환자의 비용 부담은 전혀 없다. 유전자 검사·진단을 포함한 정밀의료, 표적·면역항암제 개발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
가령 HER2 유전자가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된 유방암·위암 환자 치료에 쓰이는 항암제 A는 같은 유전자가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된 대장암·폐암 환자에서도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그런데 이 유전자가 과도하게 활성화된 대장암·폐암 환자의 숫자가 적으면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높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임상시험을 하는 데 소극적일 수 있다.
하지만 사업단이 중심이 돼 전국 병원에서 임상시험을 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임상시험 건수를 채우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당연히 임상시험 기간과 적응증 확대·판매 허가를 받는 데 걸리는 기간도 짧아진다.
사업단에는 고려대 안암병원·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과 대한항암요법연구회, 삼성SDS·마크로젠 등 병원, 종양내과의사 학술단체, NGS·데이터관리 기업 등이 이름을 올렸다. 사업단은 운영·자문·평가위원회와 유전체검사, 임상시험, 암환자 임상데이터 관리 부분 등으로 꾸려진다.
사업단의 역할은 다양하다. 우선 임상시험을 설계하고, 참여 병원을 모으고, 제약회사와 협상해 임상시험용 항암제를 확보한다. 병원에서 환자의 암조직·혈액 등 검체를 보내오면 DNA를 검출한 뒤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Next Generation Sequencing)을 통해 정상인과 염기서열이 다른 부분이 있는지, 즉 변이가 있는지 검사한다. 350개 안팎의 암 관련 유전자를 대상으로 변이 여부를 확인하면 이 유전자를 억제하는 맞춤형 표적 항암제를 고를 수 있다. 항암제는 임상 2상 시험 단계일 수도 있고 이미 다른 암 치료제로 시판 허가를 받았을 수도 있다. 암 환자들의 임상 경과와 항암치료 결과는 의사들이 사업단 전용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입력한다. 이 과정에서 암 환자들의 유전체·진료정보 등이 빅데이터로 구축된다.
김 단장은 “현행 표준요법이 듣지 않는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 맞춤형 항암치료 임상시험인 만큼 식약처가 신속심사제를 적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단을 잘 이끌어 유전체에 기반한 암 정밀의료의 대중화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김 단장은 대한암학회 이사장, 아시아 임상종양학회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