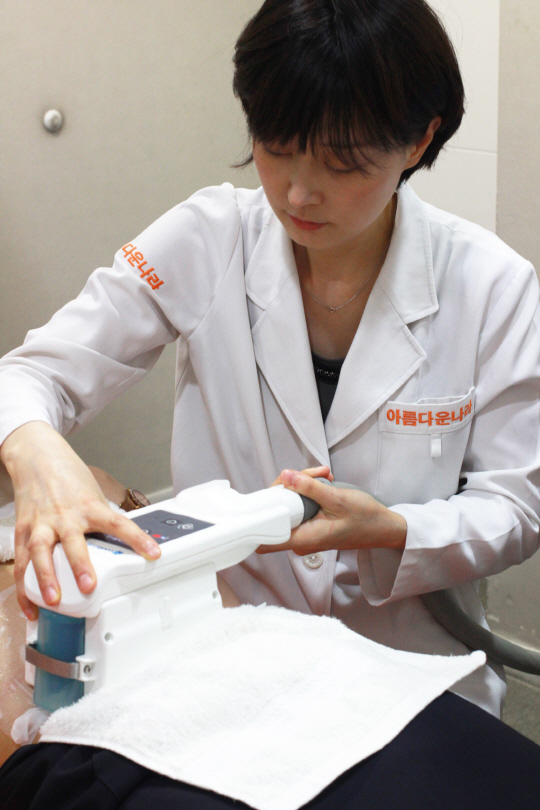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40%, 여성의 26%가 비만군에 속한다. 여성은 비만 유병률이 10년 전보다 1%포인트 줄었지만 남성은 오히려 5%포인트 늘었다. 특히 30대 남성은 비만 유병률이 44%로 가장 높다. 이들 연령대에는 사회에 진입한 지 몇 년 안 된 초년생이 많아 회식이나 음주가 잦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반면 운동량은 부족하다.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늘면 식욕을 부추겨 복부 등에 지방이 쌓인다. 남자는 허리둘레 90㎝(35.4인치), 여자는 85㎝(33.5인치) 이상을 복부비만으로 본다.
보통 나이가 들면서 ‘나잇살’이라고 불리는 내장지방이 쌓인다. 내장지방을 억제하는 호르몬과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피부 탄력은 떨어지고 팔뚝·배 등의 피부가 처진다.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30세 전후부터 서서히 줄어든다.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갱년기(폐경이행기)를 전후로 급감해 폐경 이후 골다공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폐경 전 여성 중에는 피부 아래층에 지방이 많고 내장지방은 적은 피하지방형이 많다. 하지만 폐경이 지난 여성과 중장년 남성은 복벽 안쪽 내장에 지방이 쌓이는 내장지방형이 다수다. 나잇살이 붙으면 윗배가 볼록 나온다. 내장에 지방이 집중적으로 쌓인 ‘윗배 볼록형 비만’인데 아랫배에 피하지방이 쌓인 ‘아랫배 볼록형 비만’보다 건강에 해롭다.
내장지방이 많아지면 인슐린 작용을 방해하고 염증 물질이 증가한다. 지방이 혈액에 쉽게 유입돼 혈관 벽에 쌓이므로 고지혈증·당뇨병·고혈압·뇌졸중 등 심·뇌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이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수면무호흡증의 위험인자이기도 하다. 나잇살이 일반적인 복부비만보다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복부비만과 노화는 무릎관절염과 허리 디스크 등 근골격계 질환을 재촉한다. 각종 암이 생길 위험도 커진다.
사회생활 초년병인 20~30대는 음주·회식이 잦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늘면 식욕을 부추겨 복부비만으로 이어지기 쉽다. 국수·빵 등 밀가루 음식과 술을 좋아하는 40~50대라면 겉보기에는 날씬하지만 배가 나온 마른 비만이 되기 쉽다. 나이가 들수록 적은 양의 탄수화물도 지방으로 쌓이는 만큼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다.
여성 나잇살의 출발점은 임신이다. 태아 보호를 위해 복부에 지방이 축적되는데 아기를 낳은 뒤에도 1~4㎏가량 남아 피부와 근육을 처지게 만든다. 모유 수유는 이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산모는 하루 700~800㎉를 모유 수유에 쓰는데 이 중 300㎉는 복부를 중심으로 지방이 연소되면서 나온다. 임신으로 붙은 배·엉덩이·허벅지 살을 요가 등으로 빼주면 중년 이후 나잇살이 덜 붙는다. 갱년기가 되면 여성호르몬이 급감해 4~7년간 3~6㎏ 정도 나잇살이 찌게 된다. 젊을 때는 주로 아랫배에 피하지방이, 폐경 이후에는 내장지방이 윗배에 쌓인다.
나잇살은 쉽게 빠지지 않는다. 근육과 기초대사량이 줄어 같은 열량을 섭취해도 덜 소비되기 때문이다. 탄수화물 중심의 식단은 복부비만의 지름길이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량이 줄고 팔뚝 등의 피부가 늘어지기 쉽다. 나잇살을 뺀다고 식사량을 줄이면 근육의 단백질을 녹여 혈당을 만들기 때문에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전체적인 열량 섭취는 줄이되 껍질 벗긴 닭고기, 기름기 없는 소고기 안심·사태살·홍두깨살 등으로 단백질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다. 물에 타 먹는 단백질보충제도 추천할 만하다.
체지방이 잘 타도록 도와주는 비타민B군이 들어 있는 종합비타민제나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도 뱃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된다. 부족할 수 있는 칼슘은 저지방 우유 등으로 보충하도록 하자. 칼슘은 지방 흡수를 억제하는 동시에 지방 대사를 촉진한다. 하루 한 숟가락 정도의 견과류 섭취는 혈관을 깨끗이 청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므로 신체 활동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나잇살을 제대로 빼려면 식생활 개선과 함께 반드시 운동을 해야 한다. 걷기, 가벼운 등산·아령, 배드민턴,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등은 나잇살을 빼고 근육의 퇴화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
조수현 중앙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나잇살을 빼겠다는 계획을 세우기 전에 병원에서 몸 상태를 확인하고 다른 질환 때문인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영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적절한 영양 공급과 함께 신체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