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주택이 고층건물보다 지진에 취약합니다. 수도권에서 지진이 난다면 아파트보다 오히려 저층 주택단지의 피해가 클 텐데 내진보강을 하려고 해도 현실적 애로가 큽니다. 정부의 지원도 턱없이 부족하고요.”
김영민(46·사진) 명지대 건축학부 교수는 2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12월부터 2층, 연면적 200㎡ 이상 건물의 내진설계가 의무화됐지만 그 전에 지은 것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주택 내진 기준은 지난 1988년 6층, 연면적 10만㎡ 이상을 시작으로 2005년 3층, 1,000㎡ 이상으로 확대됐다가 지난해 9월 경주지진을 계기로 다시 범위가 넓어졌다.
하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기존 저층건물의 경우 내진보강을 하려고 해도 강화된 기준을 따라야 해 애로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교수는 “내진보강을 하다 보면 기존 건물 주차장에 내진벽체를 세울 수도 있다”며 “오래된 건물의 내진보강 시 주차대수 완화 등 건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내진보강 건물주에게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짧은 주기의 고주파 지진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진동 때문에 저층건물의 피해가 더 크다”며 “대체로 내진설계가 안 돼 있는 1~5층 주택이나 경주·포항처럼 지진 단층대가 있는 지역은 내진보강이 시급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피해가 큰 필로티 건물 등의 내진보강 기술은 개발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내진보강 방법도 제시했다. 그는 “건물 특성에 맞지 않는 내진보강은 위험할 수 있다”며 “건물 유형별 내진 표준공법을 제공하고 건축구조기술사 등이 적용하도록 하는 게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내진설계를 안전과 직결되는 기둥과 보·슬래브 등에 대해서만 한다”며 “오히려 중규모 지진이 칸막이벽, 옥상 난간, 외벽치장 벽돌, 천장 마감재, 광고판, 전기·기계 설비, 가스관 등에 더 피해를 준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학교건물조차 24%가량만 내진설계 또는 보강이 돼 있는데 내진보강을 하려면 처음부터 내진설계를 하고 시공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든다”며 “학교·직장·가정에서 지진대피 훈련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광본선임기자 kbg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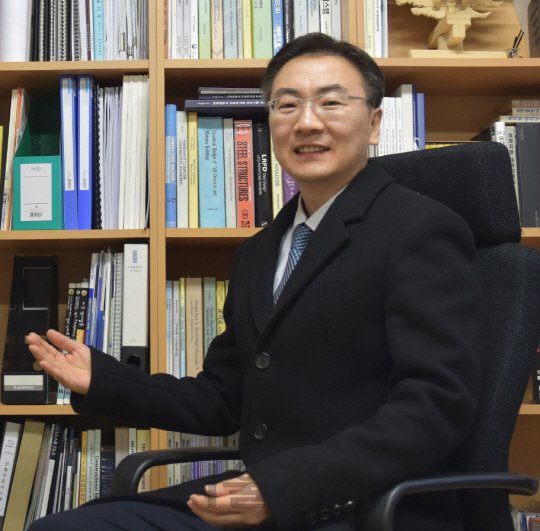

 kbgo@sedaily.com
kbg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