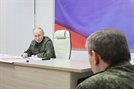기업 인수합병(M&A)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인수금융 시장에서 증권사들이 은행을 제치고 큰 손으로 나서고 있다.
2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2월 현재까지 약 15조원에 달하는 인수금융 가운데 증권사가 대표 주선을 맡은 비율이 전체의 약 60%를 넘어섰다. 특히 미래에셋대우(006800)·NH투자증권(005940)·한국투자증권이 1조원 안팎의 인수금융에서 대표 주선 금융회사로 이름을 날렸다. 대형 딜로 관심을 모은 한온시스템 인수금융 차환·코웨이 인수금융 차환·대성산업가스 인수금융·CJ헬스케어 인수금융은 모두 이 세 곳의 증권사가 대표 주선을 맡았다.
인수금융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기업 M&A 과정에서 여러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대출하는 일종의 신디케이트론이다. 단기간에 거액을 3년에서 5년 만기로 빌려주는 대신 금리는 일반적인 기업 여신보다 높은 4%대 중반이다. 그러나 전략적 투자자(SI)나 재무적투자자(FI)가 될 성 싶은 기업을 사서 가치를 올리기 때문에 투자금이 늘어나면서 대규모 M&A 성사 후에는 돈을 빌려주겠다는 금융회사가 넘쳐난다. 돈을 빌리고 1년 만에 갚고 다시 빌리는 차환(리파이낸싱)도 자주 일어난다.
금융회사는 이자뿐 아니라 위험 정도를 판단하고 이를 낮출 수 있도록 대출 구조를 짜는 언더라이팅, 적절한 차입처를 물색하는 셀다운 등에서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자를 제외한 인수금융 수수료율은 1% 정도로 업계에서는 전 금융권을 합쳐 약 1,500억원 가까이 수수료 수익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 금융주선사는 바로 이 과정에서 전체 그림을 짜고 기획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동안 인수금융은 막대한 자금력을 지닌 은행의 전유물이었지만 초대형 IB가 자기자본이 4조원에서 최고 8조원 가까이 커지면서 입김이 세졌다. 특히 인수금융을 증권사에 맡기면 선순위부터 중·후순위까지 자체 투자나 다른 투자처를 찾아주면서 일이 수월하게 풀리기 때문에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 증권사의 주선으로 인수금융에 참여하는 주체도 은행 위주에서 연기금·공제회·보험사·자산운용사 등 다양한 비은행권 기관투자가가 모여들며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대형 증권사들도 인수금융 시장에 적극 뛰어들기 위한 채비를 갖추고 있다. 올 초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은 그동안 하위 부서였던 인수금융 전담 부서를 독립적인 본부나 부문으로 승격하고 인원도 대폭 늘렸다. 미래에셋은 IB3 부문에 국내 첫 인수금융 도입 증권사인 하나금융투자 출신 최훈 부문장을 내세웠다. NH투자증권은 대체투자 영역에서 대형 딜을 성사시켰던 김연수 본부장이 선봉에 섰다. 지난해 눈에 띄게 실적을 늘린 한국투자증권은 기업공개와 M&A를 두루 거친 조양훈 본부장이 승진했다. IB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증권사에 입사하면 가장 선호했던 부서는 M&A이지만 요즘은 M&A에 비해 업무 강도는 덜하면서도 수익은 잘 나는 인수금융 부서가 가장 인기 있다”면서 “증권사 입장에서도 최근 가장 먹거리로 부상하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why@sedaily.com
wh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