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준비로 지긋지긋했던 고등학교 시절의 탈출구는 낚시와 무협지였다. 학교 시험만 끝나면 동네 근처의 저수지나 강가·수로로 쪼르르 달려갔다. 물론 그 나이에 “때를 기다리며 세월을 낚았다”는 중국 주나라 건국공신인 강상(강태공)과 같은 개똥철학 따위가 있을 리 없었다. 그냥 낚시찌를 잡생각 없이 바라보거나 붕어가 퍼드덕거릴 때의 생명감이 좋았다. 한 마리라도 더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노라면 성적 걱정은 까맣게 잊혔다.
무협지도 삭막했던 수험생 시절의 연가이자 은총이었다. 황당한 스토리 전개에도 행간에 배어 있는 특유의 낭만주의나 허무주의·운명론 따위에 빠져들었다. 강호(江湖)·정사(正邪), 중원과 새외를 넘나들며 동정일미(洞庭一美)니 추혼검(追魂劍)이니, 독고구패(獨高求敗)를 주어 삼키며 날밤을 새기도 했다. 여태껏 그 시절의 무협지만큼이나 시간을 때워주면서도 감명을 준 문학작품은 만나본 적이 없다.
그때는 왜 그렇게도 낚시와 무협지에 안달복달했을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인내해야 한다고 머릿속에서 되뇌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좋은 대학이라는 미래는 불확실한 반면 눈앞의 작은 행복은 손에 잡히는 것이었다. 되돌아보면 ‘결과의 행복’보다는 ‘과정의 행복’이 더 만족감이 높다는 사실을 본능은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행복감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에 더 비례한다지 않던가.
이쯤에서 눈치를 챘겠지만 요즘 유행한다는 소확행(小確幸·작지만 확실한 행복)에 대한 잡설을 늘어놓기 위해서다.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20여년 전에 처음 사용했다는 이 용어는 요즘 한국에서 하나의 트렌드가 됐다. 가령 쉬는 날 소파에 누워 새로 개봉한 영화 보기, 수입 맥주 번갈아 가며 마셔보기, 예쁜 카페나 우동 집 순례하기, 아침 먹고 늘어지게 자기 등등이다.
이유야 뻔하다. 오늘을 희생하면 내일이 좋아질 것이라는 젊은 세대의 희망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근본 원인이야 저성장이겠지만 집값 상승, 청년 실업난, 무너진 계층 간 사다리 등 기성세대의 잘못이 더 크다. 특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지만 개개인의 삶이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정부나 사회를 믿지 못하면 마지막 안식처는 소소한 행복밖에 없다.
어찌됐든 소확행 현상은 행복의 정의, 개인과 국가의 관계 등의 측면에서 패러다임의 일대 전환을 가져올 조짐을 보인다. 소확행은 사람은 사소해도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성취감을 느낄 때 행복해하지, 거꾸로 행복해지기 위해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 준다. 행복은 결과물이지 목표가 아니라는 얘기다.
이는 일상을 희생해서라도 높은 지위, 넓은 아파트와 고급 차를 가지면 저절로 행복해질 것이라는 기성세대의 통념에 대한 반란이다. 나아가 개인의 희생, 무한경쟁, 물질주의 등 과거 고도 성장기의 가치들이 시대적 임무를 다했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소확행은 기성세대의 국가중심주의 패러다임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과거 한국은 소수의 엘리트가 국민들을 동원해 경제발전 등 국가적 과제를 달성해왔다. 386 민주화운동 세력 역시 목표가 ‘경제’에서 ‘민주화’로 바뀌었을 뿐 행태는 비슷했다.
하지만 소확행 현상은 묻는다. 왜 국가나 거창한 명분을 위해 개인들이 희생해야 하느냐고.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 만들어질 때 ‘한반도 평화’를 위해 몇몇 선수들이 탈락한 데 대해 2030세대가 반발했던 게 그 사례다. 정부가 국가 성장잠재력 후퇴를 우려해 저출산 대책을 내놓아봐야 “우리가 아기 낳는 기계냐”는 냉소적인 답변이 돌아온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1,000만원을 더 준다고 해봐야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청년층은 마이동풍이다. 기성세대는 못 마땅하겠지만 쉽게 바뀌기 힘든 흐름이기도 하다.
지금으로서는 소확행 현상이 일시적인 유행에 그칠지, 아니면 사회 저변에 뿌리를 내릴지 아직 불투명하다. 다만 ‘지금 당장 행복하고 싶다’는 젊은 세대들의 바뀐 가치관에 답변하지 않는 한 정부의 그 어떤 정책도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점은 확실해 보인다. 또한 개인과 국가 간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개헌 논의의 결과 역시 구세대간의 집권세력 교체에 불과할 것이다.choihu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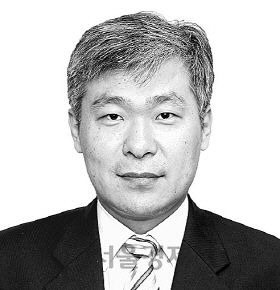
 choihuk@sedaily.com
choihu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