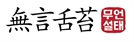현대·기아차(000270)는 지난 2016년 세계 시장에서 793만5,000대의 차를 판매했다. 불과 10년 만에 판매량은 두 배 이상 늘었고 시장 점유율은 5.7%에서 8.8%로 상승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지난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여파로 중국 시장이 반토막 났고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열풍에 대응하지 못한 미국 시장에서도 10% 이상 역성장했다. 공격적인 해외 진출로 상승 가도를 달리며 덩치를 키워놓았지만 지속 가능성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다. 단순히 판매량이 좀 줄어든 차원이 아니다. 아우디는 고속도로에서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자율주행 3단계를 구현한 신차 출시를 앞두고 있다. 테슬라발(發) 전기차 돌풍도 이미 대세로 자리 잡았다. 미국의 아마존, 중국의 디디추싱 등 다른 업종의 굵직한 기업들도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패권을 잡겠다고 아우성이다. 당장 판매량을 회복하는 동시에 미래 먹거리를 지켜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를 어떻게 풀어내는지에 따라 덩치만 큰 그저 그런 완성차 업체로 쇠퇴하느냐, 미래 모빌리티를 끌고 나가느냐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과 업계에서는 2~3년 내 현대차(005380)의 성패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본다.
◇수소차 경쟁력은 강점, 낮은 생산성은 약점=경영학에서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거나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는 데 사용하는 SWOT(Strength(강점)·Weakness(약점)·Opportunity(기회)·Threat(위협)의 머리글자) 전략으로 현대차그룹을 분석해 보면 강점과 약점은 뚜렷하다. 대표적인 강점은 최근 10여년간 비약적인 성장한 원동력, 이른바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좋은 차다. 이를 통해 미국 시장에서 일본 브랜드와의 경쟁에서 이겨냈다. 반대로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한계도 뚜렷하다. 전체 생산량의 40%가량을 담당하는 국내 공장에서 인건비는 매년 상승했고 여름이면 일손을 놓으며 파업에 나서는 노조로 인해 공장 가동에 차질을 빚기도 일쑤다. 판매 부진에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과도한 가격 인하를 하다 보니 영업이익률은 5% 안팎까지 곤두박질쳤다.
자율주행분야와 전기차·공유경제 등 산업의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데 한발 늦게 대응하고 있는 점도 현대차그룹의 대표적인 약점으로 꼽힌다. 최근 아우디와 손잡고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미 글로벌 주요 플레이어들은 한발 앞서 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최근 전기차 브랜드 EQ를 내놓고 전기차 모델을 전 차종으로 확대하고 있다. 사실상 모든 시장에서 직접적인 경쟁이 불가피한 일본 도요타는 전기차와 자율주행·공유경제를 결합한 미래의 이동수단 ‘e-팔레트(Pallete)’를 지난 1월 세계 가전박람회(CES)에서 소개하며 오는 2020년 도쿄 올림픽에 맞춰 상용화하겠다고 선언했다.
◇공존하는 기회와 위기…단기 S·O, 장기 W·O 전략 펼쳐야=시장에서는 현대차가 직면한 대외 환경이 위기이자 기회라고 본다. 단기적으로는 판매 회복이 최우선 과제다. 돈을 벌어야 과감한 투자에 나설 수 있고 수익이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중국이나 미국 시장의 상황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라는 분석이 많다. 김준성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바닥을 찍은 중국 시장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할지가 현대차의 첫 과제”라고 설명했다. 2~3년 새 획기적으로 개선된 디자인과 주행성능 등 현대차가 최근 확보한 강점을 얼마나 잘 살릴지가 관건이다.
성장세가 가파른 신시장 역시 기회 요인이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012330)는 최근 브라질 공장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 능력을 20% 이상 끌어올리는 작업에 착수했다.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남미 시장 회복세에 맞춰 판매를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기아차가 새 공장을 짓고 있는 인도도 대표적인 신시장이다.
여기까지가 완성차 업체로서의 현대차의 전략이라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할 모빌리티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수소차 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화하는 동시에 약점을 보완해 기회를 살리고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 조언이다. 공유경제 분야가 대표적이다. 각종 규제로 성장에 발목이 잡힌 국내 시장을 벗어나 신시장에서 새로운 사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엔비디아의 GPU 방식으로 갈 것인지, 모빌아이의 센서 위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