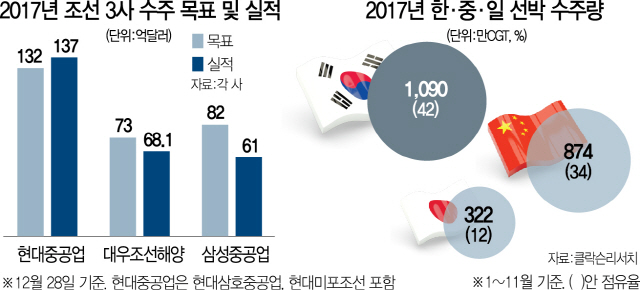최근 세밑 ‘수주 릴레이’를 펼치며 세계 1위 탈환을 눈앞에 두고 있는 국내 조선사들이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발목을 잡힐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시운전 분야의 인력 운용은 ‘발등의 불’이자 진퇴양난인 상황이다. 조선사들은 “다른 업무는 인건비 부담을 지고라도 인력을 더 투입하면 되지만 시운전 업무의 경우에는 길면 수개월 간 하루 24시간 내내 배에 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체 인력을 투입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조선사들은 시운전에 선박은 100명 안팎, 해양플랜트 등에는 수백여명을 투입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이 끝나고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초과하는 시간을 책임질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하지만 조선사들은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A조선사 관계자는 “승선하고 있는 하루 24시간을 모두 근무시간을 봐야 할지, 아니라면 교대근무 시간은 제외해야 할지 애매하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시운전 분야의 특성상 무작정 인원을 늘리기도 힘들다는 점이다. 정원이 정해져 있는 선박이나 플랜트에 3~4배 인력을 태워 3교대나 4교대 등으로 바꿀 경우 사고 위험이 늘어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선주 측이 안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다. 게다가 완성된 배나 플랜트의 모든 부분을 점검해야 하는 시운전 업무에는 고숙련 근로자들이 투입되기 때문에 우리 조선업계에 그런 인력이 풍부한 것도 아니다. B조선사 관계자는 “숙련 근로자가 부족하다고 신입사원을 태울 수도 없는 게 시운전 분야”라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늘리는 등의 조치가 없으면 시운전은 불법행위가 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사들은 이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토로하고 있다. 현재보다 인력을 최소 두 세배 늘려야 하는데 연간 수백억원대의 비용이 더 들어 간신히 기지개를 켜고 있는 국제 수주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선사들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를 통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1년은 돼야 한다”고 정치권 등에 건의하고 있지만 불투명한 상황이다. 원래 여야는 연내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지켜보고 있다. C조선사 임원은 “시운전 업무가 매일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위기간이 1년 정도 되면 업무가 많을 때 몰아서 일하는 운용의 묘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선업계는 현재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한 탄력근로제 도입 요건 역시 개별 노동자와의 합의로 완화하는 방안도 주장하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올해 한국 조선업이 7년 만에 세계 수주 1위를 탈환했고 내년은 말 그대로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하는’ 시기”라며 “다른 것은 몰라도 시운전 관련 대책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hs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