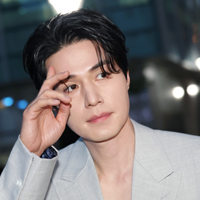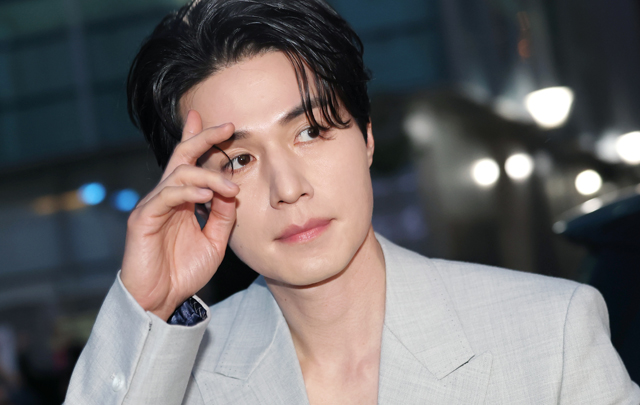박 회장은 홍콩으로 자리를 옮긴 직후인 지난해 4월 더센터 빌딩을 인수하며 업계를 놀라게 했다. 홍콩 최대 부호인 리카싱 청쿵그룹 회장의 소유로 전체 투자 규모만 3조원이 넘는 대형 거래였다. 당시 미래에셋은 국내 투자은행(IB)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며 싱가포르투자청 등 글로벌 투자자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박 회장은 홍콩 법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지 업계 전문가를 채용하는가 하면 국내 본사에서 자질이 출중한 직원은 무조건 해외로 투입했다. 박 회장 스스로 홍콩·중국·미국 등을 다니며 실제 투자처를 발굴했다.
이후 미래에셋그룹의 글로벌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도 이어졌다. 지난해 8월 동남아시아판 우버인 ‘그랩’에, 4월에는 중국 승차공유회사 ‘디디추싱’에 투자하기 위해 각각 1,686억원·2,800억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했다. 중국 1위 드론회사인 DJI에 1,200억원을 투자해 최대주주로 올라서기도 했다.
해외 금융회사가 뚫기 어려운 중국에서도 미래에셋은 꾸준히 성과를 냈다. 지난해 11월 중국에서 국내 운용사 중 처음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자격을 획득했다. 당시에도 박 회장이 중국에 머물면서 자격 획득과 관련한 시스템 구축에 직접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지난해 상장지수펀드(ETF)운용사 글로벌엑스를 인수하는 과정에도 박 회장이 직접 공을 들였다는 후문이다.
관련기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3억달러 이상 규모의 거래 제안을 받는 것은 국내에서는 미래에셋을 제외하면 많지 않다. 이 과정에서 미래에셋은 2017년 하이난그룹 투자 추진 중 무산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다만 투자 실패 과정에서도 해외투자업계에 자금조달 능력을 보여줬고 해외 투자계약 관행 등을 파악하며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는 게 미래에셋 측의 설명이다.
글로벌 사모펀드 관계자는 “국내 투자은행 중에서 미래에셋이 가장 적극적으로 모든 자원을 동원해 해외 진출과 직접 투자에 나서고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국내 시장이 한정된 만큼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why@sedaily.com
wh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