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저 TEPS 준비해야 하는데 2개월만 봐주세요.” 지난해 말 서울대 공대에 들렀을 때 한 연구실에서 박사과정 학생이 교수에게 한 얘기다. 다음달 TEPS 시험을 앞두고 병역특례를 받기 위해 이공계 박사과정 학생들이 영어에 매달리고 있었던 것. 서울대 공대의 한 석·박사 통합과정생은 “석사 학점도 보지만 TEPS 점수가 성패를 좌우해 겨울방학에 2개월간 연구실을 나오지 못했다. 간혹 한 학기 휴학하는 연구원도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모 서울대 공대 교수는 “학교를 안 나오고 영어 학원을 다니는 학생이 수두룩하다. 막으면 서운해하고 불신이 생긴다”며 “연 2회 병특 공고가 나는데 수도권은 경쟁률이 높아 학생들이 2~3차례씩 응시하곤 한다”고 전했다.
이는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현장의 허리인 학생 연구원이 연구에 몰입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김모 교수는 “서울대 공대 교수들은 평균 5개 정도의 R&D 과제를 늘 수행하는데 실험이나 연구에 지장이 많다”며 혀를 찼다.
더욱이 국방부가 지난 2016년 ‘병역자원 감소’를 이유로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을 오는 2023년까지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이공계 대학원 진학률도 급감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대 이공계 대학원의 전기와 후기 경쟁률은 각각 0.88대1, 0.95대1로 모두 미달됐다. 원자핵공학과나 조선해양공학과 등은 지원자가 확 줄었다. 김도연 포스텍 총장은 “KAIST 등 4개의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이나 포스텍, 지방대 이공계 박사과정생은 병특에 별 애로가 없지만 문제는 수도권이다. ‘SKY’조차 연구원이 영어와 씨름한다”고 한탄했다. 박홍규 고려대 물리학과 교수는 “포닥(박사후연구원)과 석·박사가 부족하다. 고려대도 몇 년 전부터 미달됐는데 포닥은 정말 없다. 서울대·KAIST조차 별로 없다”고 애로를 호소했다.
정부가 올해 20조5,000억원의 R&D 예산을 대학, 정부 출연 연구기관, 기업에 쏟아부으며 젊은 연구원의 연구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으나 현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서울대 공대의 한 석·박사 통합과정생은 “젊은 연구자에 대한 지원책이 피부에 와 닿는 게 전혀 없다. 병특 대책도 없다”고 꼬집었다. 병특을 줄이려면 이스라엘처럼 과학기술부대를 만들어 연구가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이공계 인력의 이탈도 증가하는 추세다.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경우 정부에서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2016년 133명에 이어 지난해에도 171명이 중도에 그만뒀다. 일부는 해외 기업 등에 스카우트됐지만 대체로 의학전문대학원 등으로 옮겼다. 과학고·영재고의 국제올림피아드 수상자 중에도 의대 진학 비율이 낮지 않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의 한 학생은 “평생 면허가 있는 의대·치대·한의대로 간다고 매년 서울대 공대 합격생 중 100명 넘게 입학을 포기한다”고 씁쓸해했다.
물론 고령화 시대에서 바이오 연구를 위한 의대의 역할도 크지만 문제는 기초의학을 연구하는 연구의사가 급감했다는 점이다. 연구의사는 임상의나 교수에 비해 받는 돈이 적어 의대 졸업생 중 지원자가 매년 전국적으로 10여명도 안 된다. “북쪽에서는 최고 인재가 로켓을 연구하는데 남쪽에서는 쌍꺼풀 수술을 하더라”는 탈북 과학기술인의 말이 나올 정도다.
임태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은 “IMF 후 의대 선호 현상이 심화했지만 의대로 인재가 몰리는 것은 선진국도 마찬가지”라며 “20여년 전 오송과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만들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결국 이공계든 의대든 도전하고 융복합해 성과를 내는 문화가 중요한데 저성장 시대 사회활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문과는 공무원 시험으로 몰리는 실정이고, 이공계 박사를 따도 산업 혁신과 신산업 육성이 더뎌 취업률이 60~70%대(비정규직 포함)에 불과하다. 반면 벤처·스타트업은 우수인력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팁스(TIPS·민간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지원 프로그램) 벤처사인 이오플로우의 김재진 대표는 “고급 엔지니어가 벤처·스타트업에 잘 안 들어와 고민”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분야는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중국에서 사람을 더 빼가지 않을까 노심초사한다.
따라서 인력 미스매치를 줄이며 제2의 벤처 붐을 조성해 역동적인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기욱 미국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장은 “스탠퍼드대에서 똑똑한 학생은 대학원을 가거나 교수·의사가 되는데, 그중 정말 똑똑한 친구는 중퇴하고 창업을 한다. 야심이 있다면 대기업보다 고생스럽더라도 스타트업을 선호한다”고 실리콘밸리 문화를 설명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만을 선호하는 한국과 대비된다.
이정동 청와대 경제과학특별보좌관(서울대 공대 산업공학과 교수)은 “미국 통계를 보면 다양한 경험을 쌓고 30대 후반부터 창업하는 게 성공 확률이 높다”며 “젊은이들에게 도전하라고 등만 떠밀 것이 아니라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젊은 층이 벤처에서 스톡옵션도 받고 경험도 쌓다가 창업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신산업을 가로막는 규제도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광본선임기자 kbg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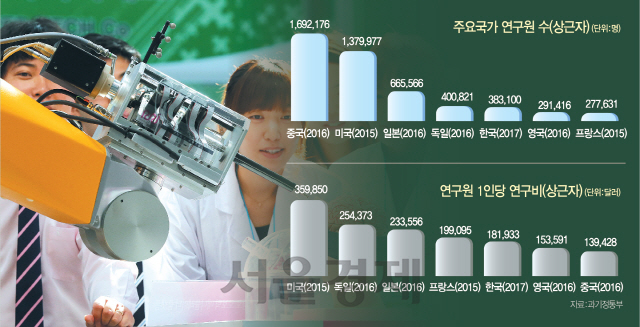


 kbgo@sedaily.com
kbg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