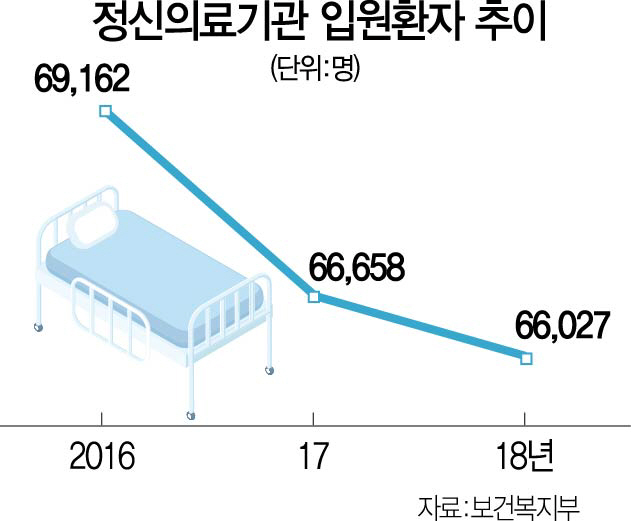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대책을 개선한 ‘중증 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조현병·조울증·우울증 등을 앓는 국내 중증 정신질환자가 50만여명에 이르지만 33만여명이 ‘관리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조기에 환자를 발굴해 체계적인 치료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내년 말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한다. 야간과 휴일을 포함해 24시간 운영하는 응급개입팀은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건 현장에 경찰·구급대와 함께 출동해 정신질환 여부를 파악하고 향후 상담과 치료를 제공한다. 올 하반기에는 자해 등 극단적인 선택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24시간 진료하는 정신응급의료기관도 새로 지정한다. 경찰이나 구급대로부터 환자를 인계받아 증상을 파악한 후 입원시키거나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전국 237개소에 근무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 확충도 당초 목표했던 오는 2022년보다 1년 앞당긴다. 센터당 평균 4명이 인력이 보강되면 현재 전담직원 1명당 60명 수준인 관리 대상자가 25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정신질환자가 입원을 거부하면 지자체장이 입원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입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한다.
정부가 뒤늦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의료계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정신질환의 특성상 꾸준한 치료가 필수적인데 치료를 받다가 중단하거나 아예 병원을 찾지 않는 환자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어서다. 특히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강제하는 외래치료명령제는 기존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최근 1년 동안 외래치료명령을 받은 환자가 4명에 불과할 정도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의료진이 외래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보호자가 반대하면 막을 근거가 없어서다.
신권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외래치료명령제를 활성화하려면 치료비와 약값을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의료기관이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이 큰 만큼 제3의 기관이 이를 판단하는 ‘사법입원’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