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월 11일, 애플의 최고운영책임자(COO)였던 팀 쿡은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스티브 잡스였다. 간 이식 수술을 받고 췌장암 치료를 병행하고 있던 잡스는 쿡에게 자신의 집으로 “지금 당장” 와 달라고 했다. 쿡은 즉시 달려갔다. 초췌한 얼굴로 마주 앉은 잡스는 “애플의 CEO를 맡아 달라”고 말했다. 자신은 비상근으로 물러나 이사회 의장직을 맡겠다고 덧붙였다.
“몸이 점점 나아지는 것 같다”고 생각한 쿡의 기대와는 달리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은 그 해 10월 5일 잡스는 세상을 등졌다. 거의 모든 언론과 분석가들은 마치 하늘이 무너진 듯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나 ‘조용한 살림꾼’ 쿡이 혁신의 상징인 잡스의 뒤를 잇는다는 점에 관해서는 일제히 부정적 의견들이 쏟아졌다. 누구였건 간에 ‘잡스의 후계자’는 어려운 자리였겠지만 최소한 그것이 팀 쿡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 전문가들의 예상은 빗나갔다. 근본적인 혁신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기는 하나 실적 면에서 애플은 건재하다. 애플은 세계 최초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다. 2010년과 비교해 현금 보유액은 네 배 가량 늘었고 주가는 2011년보다 3배 가까이 뛰어올랐다.
20년간 애플을 취재해 온 애플 전문 기자 린더 카니가 쓴 신간 ‘팀 쿡’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전례 없는 성공을 누리고 있는 ‘팀 쿡의 애플’을 보여준다. 잡스가 전 세계를 미치게 만드는 선지자적 CEO였다면 쿡은 너무도 얌전하고 안정과 실리에 충실한 모범생이었다. 왜 잡스는 자신과 너무나 다른
쿡을 택했을까. 책은 그 ‘다름’이 이유였음을 쿡이 살아온 삶의 궤적을 통해 영화처럼 보여준다.
쿡은 미국 남부 앨라배마 시골 마을에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산업공학을 전공하고 IBM과 IE, 컴팩 등을 거쳐 37세였던 1998년에 애플의 사업운영 부문 수석부사장으로 영입됐다.
잡스가 이끌 던 ‘신화’에 집착하지 말고 냉정하게 그 시절 애플을 돌아보자. 오직 제품만 바라봤던 잡스의 애플은 걸핏하면 자금난에 시달렸다. 재고와 원가, 공급망 관리가 엉망이었다.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혁신적 제품을 내놓고도 손해를 떠안았다.
애플의 현실을 들여다본 쿡은 제조와 유통을 총체적으로 정비하고 나섰다. 놀랍게도 쿡은 잡스가 그토록 강조해 마지않던 ‘심플함’을 공급망 관리에서 보여줬다. 쿡은 합류한 지 7개월 만에 30일 이상이던 재고를 6일 치로 줄였고 아웃소싱을 본격화 한 공급망 관리로 애플을 흑자전환으로 이끌었다.
애플의 제품은 호평 일색이었지만 경영에서는 혹평이 많았다. ‘포춘’지가 선정한 ‘500대 살인기계’에 들 정도로 노동 착취의 비판을 받았고, 진보적인 기업이라는 이미지와 달리 세금을 회피하고 기부에 인색했다. 내부적으로는 살벌한 경쟁 분위기가 맴돌았고 독선적인 CEO를 견디지 못한 인재들이 애플을 떠났다.
팀 쿡의 강점은 인권과 환경, 다양성을 존중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사생활을 공개하지 않는 조용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커밍아웃’을 선언했다.
“만약 애플의 CEO가 게이라는 소식이 자신의 성 지향성과 관련해 고민하는 누군가에게, 또는 혼자라고 느끼는 누군가에게 도움이나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이것은 저의 프라이버시를 희생하더라도 밝힐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자는 잡스가 구축한 혁명적인 ‘하드웨어’ 위에 쿡은 새로운 ‘기업가치’를 입히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런 맥락에서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는다. 그는 “애플의 위대한 3막은 의학과 보건, 피트니스, 자동차, 스마트홈 등 아직 컴퓨팅이 정복하지 못한 무대에서 펼쳐질 것”이라며 “애플의 미래 전망 또한 무척이나 밝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직도 세상은 팀 쿡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2만5,000원.
/조상인기자 ccs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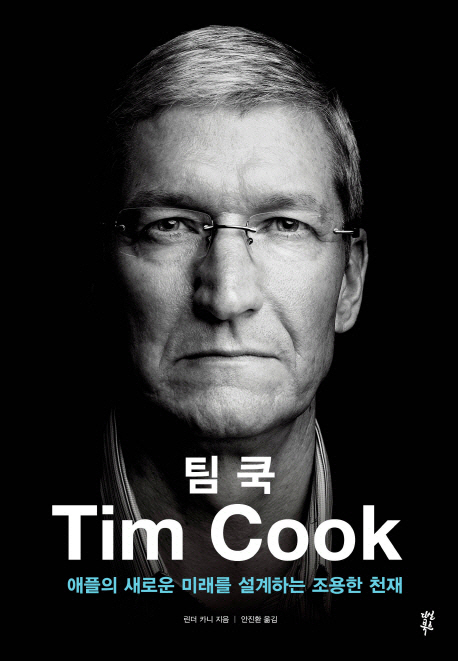


 ccsi@sedaily.com
ccsi@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