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6월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문한 서울대학교 메르스 격리 치료 병동. 여기서 대통령이 의료진과 통화하며 환자 치료를 독려하는 사진 한 장이 찍혔다.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전염병 확산으로 사망자가 속출하는 사태에 대통령이 단호하게 대응하는 긴박함보다는 벽면에 붙은 A4용지 한 장이 먼저 들어왔다. ‘살려야 한다.’
엄중한 상황에서도 어이없는 웃음을 참기 힘들었던 그 궁서체의 문구는 패러디의 대상이 됐고 온갖 모작들을 만들어냈다.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나름 고심한 끝에 탄생했던 청와대의 그 연출 사진이 왜 웃음거리에 그쳤을까. 모두 기억하듯 당시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대응 탓이었다.
바레인에서 귀국한 첫 번째 감염자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그해 5월20일. 이 환자 역시 세 곳의 병원을 전전한 후 입원한 종합병원에서 메르스 의심 사실을 정부에 알렸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앞서 18일 “바레인은 메르스 발병지역이 아니다”라며 검사를 거부했다가 이틀 후 감염을 인정했다.
그런데 첫 확진자가 나온 후 2주가 지난 6월2일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메르스 환자가 병원을 방문했다고 특정 병원을 가면 안 된다는 건 과도한 우려”라며 방문 병원 비공개의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가 메르스 발병국 2위에 오르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오판이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심야 언론 브리핑까지 열며 “35번 확진자의 접촉자 수가 1만5,000여명에 달한다”는 정보 공개에 나선 것이 6월4일이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팬데믹(감염병 대확산)을 막지는 못했다.
이후에 벌어진 사태는 차마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다. 어쩌면 모두의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상처일지도 모른다. 정부가 메르스 상황 종료를 선언한 것은 첫 환자가 발생한 후 218일 만인 그해 12월24일, 성탄절 전날이었다. 186명이 감염됐고 그중 39명이 숨졌다(74번 환자는 2017년 9월 사망).
메르스에 이어 일곱 번째 변종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첫 번째 확진자가 지난달 20일 발생한 후 3주가량이 지났다. 그동안 환자는 27명으로 늘었고 접촉자는 1,700명에 달한다. 수 주 동안 신종 코로나의 확산 소식과 정부 당국의 대응을 전달하면서 2015년 봄이 오버랩됐다. 그러면서 의문이 든다. 그때는 ‘철저히 틀렸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지만 그렇다고 지금은 ‘맞는’ 것일까. 다른 의문도 든다. 감염병 대응의 ‘부실’과 ‘과잉’의 기준은 무엇일까.
확산 초기였던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과도한 불안감, 막연한 공포와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신종 코로나 종합 점검회의)”고 말했다. 당시 중국의 사망자가 수백명에 달했고 진원지인 우한에서는 엑소더스가 벌어진 상황에서 ‘과도한’ 불안과 ‘막연한’ 공포라는 것이 무엇인가. 며칠 후 대통령은 “감염병은 과잉 대응하는 것이 낫다”며 말을 바꿨다.
2일 중국 후베이성 체류자의 입국제한을 발표했던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관광목적의 단기비자 발급 중단”을 2시간 후 “검토”로 번복하며 혼란을 부추겼다. 9일 “중국 내 다른 위험지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도 상황에 따라 추가로 검토할 것”이라는 정세균 국무총리(중앙사고수습본부 확대회의)의 발언 역시 회의 직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현행 유지”로 없던 일이 됐다.
정부가 신뢰를 잃으면 국민의 동요는 더욱 커지고 막연한 공포와 과도한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롯되는 자발적인 대응을 과도하다고 지적하기 힘들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확진자 동선 퍼 나르기나 빛의 속도로 퍼지는 맘카페의 정보 확산을 통제할 수도 비난하기도 어려운 이유다. 그렇기에 감염병에 대응하는 정부와 관료의 자세는 여느 때보다 신중하고 단호해야 한다.
신종 감염병과의 힘겨운 사투도 결국에는 종료되고 일상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마스크와 손세정제가 필요없는 ‘편안한’ 출퇴근이 가능할 무렵 메르스 때의 그 ‘살려야 한다’와 같은 우울한 기억은 떠오르지 말아야 한다.
ju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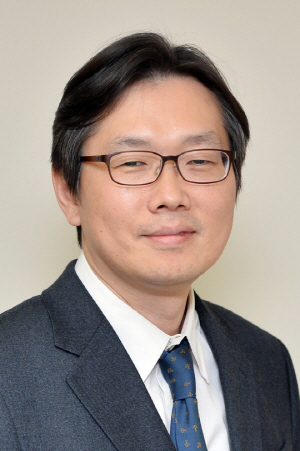
 june@sedaily.com
jun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