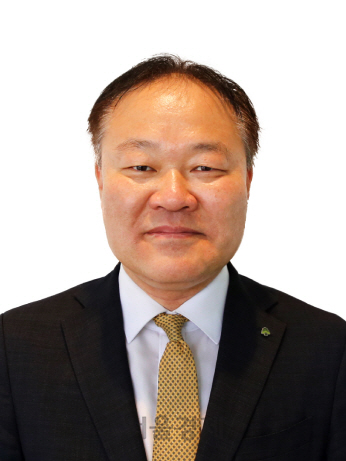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 금융시장에서는 종종 사고가 난다. 조달 비용이 싼 ‘이지머니’가 흘러넘치면 부주의한 투자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앞으로 걱정되는 영역은 상장 전의 발행시장, 즉 ‘프리IPO(기업공개)’ 또는 ‘스타트업 시장’이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기존 중후 장대형 산업들은 대부분 글로벌 공급과잉에 노출돼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또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로 자금을 공급해줘야 한다는 데도 이견이 크지 않다. 지적하고 싶은 점은 1차적으로 자금이 공급되는 ‘발행시장의 열기’와 주식이 거래되는 ‘유통시장의 썰렁함’이 주는 괴리다.
정책자금을 중심으로 발행시장으로 막대한 돈이 흘러 들어가면서 스타트업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오히려 자금이 흘러 넘친다는 평가도 있다. 나쁜 일은 아니다. 문제는 이렇게 투입된 자본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주식시장 상장 이전에도 높은 가치로 평가받는 유니콘 기업들이 있기도 하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성공의 사례다. 발행시장에 투자된 자금을 회수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IPO를 통한 주식시장 상장이다.
작년 벤처투자 규모는 4조3,000억원에 달했다. 스타트업 한 곳당 30억원씩 자금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1,400개가 넘는 스타트업이 자금조달을 했다. 올해도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2조5,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가 조성될 예정이다. 발행시장에서 자금 조달의 수혜를 누리는 스타트업은 이렇게 많은데 한 해에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되는 기업 수는 100여개에 불과하다.
신규 상장 기업 수와 발행시장 자금 조달 기업 수의 미스매치도 심하지만, 더 걱정되는 것은 벤처기업들의 주식이 거래되는 코스닥시장 자체가 장기 침체에 빠져있다는 사실이다. 궁극적으로 코스닥시장이 살아야 초기에 돈을 태운 모험 투자자들과 한 번 걸러져 상장된 기업에 투자하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가 윈윈하는데, 우리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코스닥시장이 장기간 부진한 데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을 테고, 시장을 인위적으로 살릴 방법도 없다. 또한 모든 버블에는 후유증이 따르지만, 기술기업들이 주도하는 벤처 버블은 나름의 순기능이 있기도 하다. 2000년대 초 닷컴 버블이 지나간 후 코스닥시장을 풍미했던 많은 기업이 도산했지만, 그래도 인터넷 전용망이라는 물적인 토대는 남아 이후 IT(정보기술) 강국 코리아를 만드는 초석이 됐다.
다만 코스닥 투자를 바라보는 일부의 시각은 꼭 지적하고 싶다. 기업의 성장성을 사고파는 코스닥시장의 성격상 코스닥 투자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속성이 있다. 코스닥 투자는 기본적으로 투자자의 기대수익과 위험선호에 따른 선택의 문제지만 코스닥 시장에 대한 투자 자체를 터부시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혁신성장의 동력으로서의 스타트업 기업과 주식투자 대상으로서의 코스닥 상장기업은 과연 서로 다른 존재인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것은 투자고, 내가 모르는 코스닥 기업 주식을 사는 것은 투기인가. 그러면서 한국 경제의 지나친 삼성 의존도를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다. 이런 행태는 무지나 위선의 산물일 뿐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