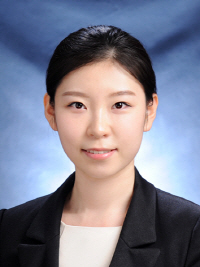“마스크 없습니다.”
서울 용산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매일 앵무새처럼 이 말을 반복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손님이 뚝 끊긴 가운데 그나마 편의점을 찾는 사람들도 마스크를 문의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A씨는 “왜 올 때마다 마스크가 없느냐고 항의하는 손님들과 매일 입씨름을 벌인다”며 “판매는커녕 아르바이트 직원을 줄 마스크도 동났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대란에도 편의점은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마스크가 이례적으로 편의점 월간 매출 톱5에 오르는 등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번 주부터 아예 발주가 중지되면서 편의점 진열대에서 마스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공적 판매처 비율이 50%에서 80%로 향상되면서 마스크 입고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며 “가맹 본부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 풀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20%가 유통업체·제조업체·병원·지방자치단체 주문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사실상 편의점으로 들어오는 물량은 거의 없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편의점도 공적 판매처에 포함하려 했지만 물량 부족을 이유로 제외했다. 이에 편의점 업계는 접근성이 뛰어난 유통망이라는 점과 정찰제 운용으로 마스크 가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을 들며 꾸준히 공적 판매처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집과 회사 앞에 있는 수많은 편의점을 빼고 찾기도 어려운 우체국이나 농협 등을 판매처로 선정한 것이 단순히 공적 유통처라면 현실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전국 편의점 점포 수는 4만5,000여개로 약국(2만4,000여개)의 2배에 달한다. 접근성이 뛰어난 편의점 유통망을 활용하면 특정 장소에 인파가 몰려 장시간 대기하는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정부가 마스크 대란을 잡기 위해 5부제를 처음으로 시행한 지난 9일에도 약국 앞에는 100여명이 긴 줄을 섰다. 반면 지하철 역사 등에서는 마스크 가격이 치솟았다. 현실을 외면한 정책에 불편을 겪는 건 소비자들뿐이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