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왜 감염병 백신을 개발하느냐’고 묻는데 올해는 당장 못쓰더라도 겨울에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1918년 ‘스페인독감’처럼 어떤 급박한 미래가 올지 모르니 의미가 있죠.”
면역학자인 신의철(49·사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의과학대학원 교수는 19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여름이 되면 가라앉을 수 있지만 겨울이 오면 어디서든 크고 작은 난리가 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교수는 연세대 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미생물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뒤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2007년부터 KAIST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신 교수는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스페인독감 때도 다음 여름에는 주춤했다가 겨울에 다시 생겨 더 큰 피해를 입혔다”며 “코로나19도 생겼다 사라졌다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어 면역이 잘 안 되는 노인들은 위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가 풍토병처럼 될 가능성이 있어 조기에 치료제를 개발하고 백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종이 수백 가지에 달하는데 백신이 다 커버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백신학적 관점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코로나바이러스인 사스와 메르스도 변종이 별로 없었고 코로나19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물론 5년이나 10년 뒤 또 다른 신종 바이러스가 나올 가능성은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사스와 메르스의 경우 유행이 끝난 뒤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중도에 멈춘 바 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장이 최근 “백신이 1년이나 1년 반 뒤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그는 “빠르기는 하지만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해석했다. 중국의 경우 인민해방군도 백신 임상에 뛰어들었는데 속도에만 중점을 둔다면 상용화는 앞당겨질 수 있으나 부작용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신 교수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최근 국내 대표적 DNA 백신 개발사인 제넥신의 성영철 대표(포항공대 교수),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 생산업체인 바이넥스의 이혁종 대표, 국제백신연구소의 제롬 김 소장, 영장류 실험을 하는 제넨바이오의 김성주 대표, 마우스(쥐) 모델의 세포면역학 권위자인 이승우 포항공대 교수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KAIST에서는 면역학자인 박수형 교수도 함께한다.
신 교수는 “생산이 빠르고 단가가 싸며 안전성 우려가 별로 없는 DNA 백신을 개발할 것”이라며 “오는 7월에 안전성을 따지는 임상1상에 들어갈 예정인데 가을께 끝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겨울이 오기 전 1상을 마친 후보물질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용량이나 효과까지 따지는 2상·3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협의가 필요해 예측하기 힘들다”고 했다.
신 교수는 “당장 기존 약물을 활용한 치료제 개발이 급선무지만 경증·중증·사망·회복 등 병태생리학적 면역반응을 깊이 연구해야 근원적인 치료제나 백신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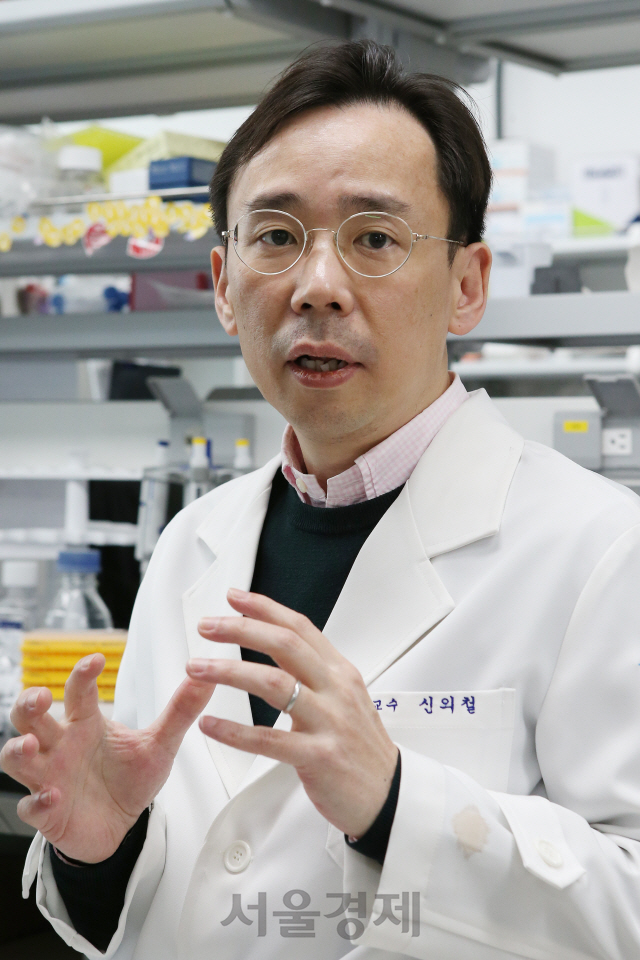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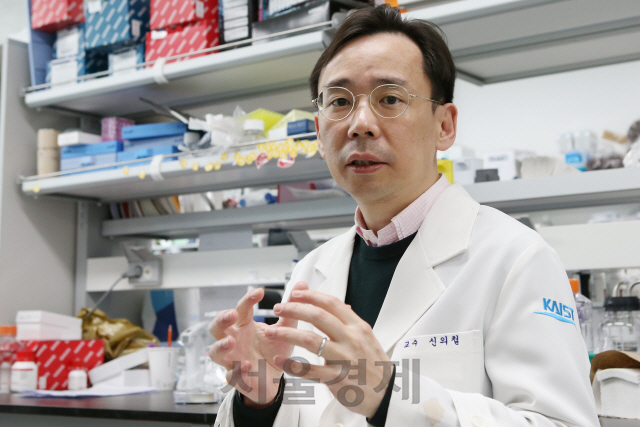

 kbgo@sedaily.com
kbg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