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출신의 화가 에드워드 호퍼(1882~1967)의 대표작 중 하나인 ‘밤 올빼미’는 참으로 적적한 그림이다. 늦게까지 깨어있는 사람을 뜻하는 제목처럼, 카페를 찾은 3명의 손님과 점원이 등장한다. 혼자 독주를 들이키는 것만 같은 중절모의 사내는 등을 돌리고 앉았고, 나란히 앉은 두 남녀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는다. 둘의 손끝은 닿아 있지만 앞을 응시하는 남자의 표정은 음울하고,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는 다른 손에 든 뭔가를 바라보고만 있다. 일하는 종업원에게는 아무도 관심 없다. 지독하게 외롭기만 한 이 그림을 현대인은 왜 그토록 좋아한단 말인가.
충북대 독문학과 교수인 저자는 호퍼의 이 그림을 살펴보기에 앞서 “보편적 감정이라면 흔히 사랑·박애·동정·연민 같은 것을 떠올리기 쉽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고독”이라며 “늦은 밤의 고적(孤寂)과 도시의 냉기, 인간관계의 외로움이 묻어있다”고 평한다. 저자는 또 카페가 유리창으로 둘러싸여 ‘분리’된 상황이기에 외로움이 배가되는 듯하지만 동시에 “그림 속 그들의 고독은 그림 밖 우리의 고독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고 곱씹는다. 도시화로 인한 인간의 고독과 익명성을 파고든 호퍼 그림의 “차갑고 냉정한 묘사”와 “모순을 가로지르며 모순을 드러내는” 샤를 보들레르의 시를 살펴보고서야 저자는 평범한 것들의 고귀함을 드러내는 예술의 가치를 이야기한다. “예술은 삶의 악취와 슬픔과 맹목을 외면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직시하고, 나아가 표현한다.” 현대사회의 고독을 직시하고, 외로워 흐느끼는 이가 나뿐 아님을 일깨워주는 것, 그게 바로 호퍼가 사랑받는 이유다.
관련기사
프란시스 고야의 참혹한 그림들이 걸작으로 칭송받는 것은 인간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불러온 재앙을 ‘살펴보고 직시하며 잊지 않게’ 했기 때문이다. “이성을 외면하지 않은 채, 이성의 힘으로 불합리한 세계를 직시하면서 이 세계를 표현 속에 증언하는 것이야 말로 예술의 일”인 까닭이다. 저자는 렘브란트, 카라바조, 페르메이르의 그림을 들추며 철학과 미학을 이야기 한다. 샤르댕의 정물화나 코로의 풍경화를 통해 그림의 시적 성격을 고민하기도 한다.
340쪽 분량의 책을 다 돌아 나올 때쯤 ‘예술과 나날의 마음’이라는 책 제목이 다시 보인다. 저자에게 그림을 보거나 책을 읽고 음악을 듣는 일은 “내가 모르는 세상의 다른 풍경을 만나는 일”이라고 한다. 그것은 ‘느낌의 풍경’이자 ‘생각의 풍경’을 경험하는 일이고 이런 느낌과 생각과 나날이 우리 삶을 구성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1만9,000원.
/조상인기자 ccs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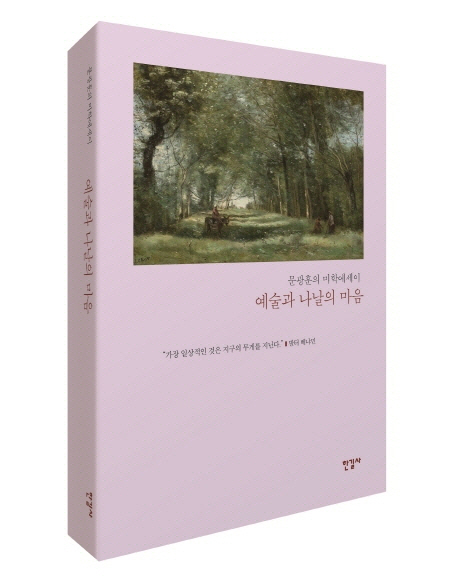

 ccsi@sedaily.com
ccsi@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