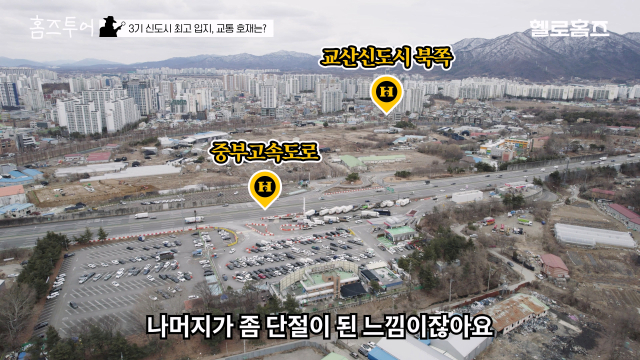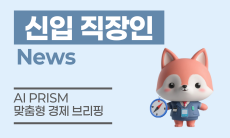지난 일요일 퇴근길 아내와 동대문의 한 아웃렛에 들렀다. 폐장을 2시간여 앞둔 시간이었지만 주말 오후의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의류매장에서 만난 직원은 “오늘 손님이 너무 많아 혼이 쏙 빠졌다”며 힘들어했다. 식당가의 스테이크 전문점에도 커플·가족 손님들이 가득했다. 그들 모두에게서 생기가 넘쳤다. 그날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후 처음 맞는 주말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1년 가까이 인류의 일상을 망가뜨리면서 사람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그려보고는 한다. ‘직장이나 학교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 ‘극장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등으로 시작하는 상상은 대게 현실의 갑갑함이 투영돼 ‘언제쯤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까’로 끝을 맺는다. 꼬리를 무는 질문 중에 늘 이런 것도 한 번쯤 떠오른다. ‘앞으로 사람들은 쇼핑을 어떻게 할까.’
책상 앞에서 혹은 침대에 누워서 손끝 하나로 가능해진 모바일 쇼핑 덕분에 마트에서 카트를 끄는 수고가 연중행사가 된 지 오래전이다. 그런 놀라운 변화가 코로나19 환경에서 더욱 달라졌다. 지난 9월 국내 식료품앱의 사용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3%나 늘어 400만명에 육박했다. 모바일 장보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다. 결국 눈부시게 발전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플랫폼이 ‘1,000원만 깎자’는 전통시장의 북적거림과 ‘지금부터 왕창 세일’한다는 대형마트의 타임 딜을 추억으로만 남기게 할까.
미국에서 창업 20년을 갓 넘긴 아마존이 세계적인 유통공룡 월마트의 시가총액을 제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을 무렵 정보기술(IT) 전문가들은 오프라인 쇼핑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고 떠들었다. 그게 2015년 7월, 벌써 5년 전 일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아마존의 성장세는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한물갈 줄 알았던 월마트의 선전도 기대 이상이라는 점이다. 월마트의 올해 2~4월 매출은 1,346억달러(약 156조2,168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 순이익은 40억달러(약 4조6,424억원)로 3.9% 늘었다. 월마트의 전략은 모바일로 주문한 후 매장에서 들고 오는 온오프라인 쇼핑의 결합이었다. 옴니채널로 불리는 이 서비스는 온라인 쇼핑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경험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했다. 탄력을 받은 월마트는 아마존 프라임과 같은 정기구독 서비스 월마트 플러스도 곧 시작한다.
월마트의 선전과 변신은 유통산업에서도 결국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공존하게 될 것이라는 미래를 보여준다.
그런데 월마트 같은 도전과 혁신을 롯데와 이마트도 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힘들어 보인다. 출점제한과 의무휴업 등 유통 관련 규제를 보면 대형마트는 ‘적폐’ 산업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일요일에 대형마트가 문을 열어야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오고 그래야 전통시장도 골목식당도 제법 장사가 된다는 보고서가 줄줄이 나왔지만 유력한 정치인들의 첫 번째 행선지는 늘 서울의 유명 시장이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시장 반경 20㎞ 내에는 대형마트가 못 들어오게 한다”거나 “문 닫는 일요일을 늘리겠다”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하지만 그런 규제로 전통시장의 벌이가 괜찮아졌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이제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커머스 모두가 융합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때가 아닐까.
일요일 저녁 동대문 아웃렛에서 아내는 새 운동화 한 켤레를 샀다. 몇 개를 신어보더니 밑창 속이 작은 알갱이로 가득 찬 내가 보기에는 이상스러운 디자인의 것을 선택했다. 몇 만원 더 비쌌지만 “착화감이 끝내준다”며 단숨에 결정했다. 이런 오프라인 쇼핑에서만 가능한 경험의 가치는 앞으로도 유효해 보인다. 코로나19가 사라진 후 어느 날, 나는 어디서 운동화를 사게 될까. ju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une@sedaily.com
ju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