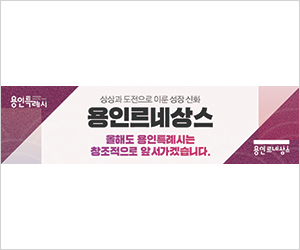한국은행이 지난해 말 공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순수한 의미의 가계 부채(1,682조 원)에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한 대금 등 판매 신용까지 포함한 가계 신용은 3·4분기 말 기준 1,940조 6,000억 원으로 불어나 사상 처음으로 명목 GDP를 뛰어넘었다.
GDP 대비 가계 신용 비율은 101.1%로 1년 만에 7.4%포인트나 치솟았다. 소득은 늘지 않았는데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가계 부담이 가중됐다. 기업 신용 규모도 GDP 대비 110.1%로 1년 만에 9.1%포인트나 올랐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 모니터에 따르면,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은 2019년 41.9%에서 2020년 48.4%, 올 해는 52.2%로 가파르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기준 GDP 대비 D2 비율이 전년보다 2.2% 증가한 42.2%로 IMF 분석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작년 말 기준 D2 비율은 5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숨은 빚’으로 평가되는 공공부문 부채(D3)는 지난 2019년 기준 GDP의 59%인 1,132조 원을 기록했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 공공 기관이 투자를 늘리고 채용을 확대하는 등 정부 정책에 코드를 맞추고 있는 만큼 올해도 공공 부채는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가계와 기업, 정부 등 경제의 3주체가 모두 빠르게 증가하는 빚의 늪에 빠지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움츠렸던 한국 경제가 다시 뛰는 데 부채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채를 당장 줄일 수 없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총량 관리도 중요하지만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부문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지원기자 gard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uniron@sedaily.com
runir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