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감사 시간 부족은 국내 회계 관행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돼왔다. 감사인이 기업에 관심을 기울이는 시간이 부족할수록 회계 부정·오류를 적발할 가능성도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18년 신외부감사법이 도입되면서 표준감사시간제가 시행된 것은 당연한 절차였다.
표준감사시간제가 시행 3년 만에 첫 수술대에 올랐다. 3년마다 한 번씩 현행 표준감사시간제를 검토하도록 한 신외감법 규정 때문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올해 안으로 표준감사시간제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표준감사시간제는 공과가 뚜렷한 분야다. 그동안 ‘을’로만 여겨지던 회계법인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감사를 펼칠 수 있도록 도와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실제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회계 투명성 순위는 2년 전보다 24단계나 뛰어올랐다. 그러나 막상 감사를 받는 기업들 사이에선 회계 비용 증가만큼 회계 품질이 개선됐다는 제도의 ‘효능감’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물론 시행 3년 차인 제도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엔 아직 기간이 짧다. 그러나 표준감사시간을 정하는 산식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고려해볼 만하다. 업종별 구분이 대표적이다. 현행 제도에선 제조·서비스·건설·금융·도소매·기타 등 6가지로만 업종을 나눠 각기 다른 산식을 적용한다. 하지만 같은 제조업이라도 반도체업과 제철업의 회계 처리는 각기 다르다.
회계 업계와 재계는 지난 3년간 표준감사시간제를 두고 각자의 이견을 충분히 드러내왔다. 신외감법이 대우조선해양 사태라는 돌발 사건의 산물이었음을 고려하면, 이번 개정안이야말로 재계와 회계 업계 간 ‘숙의’의 산물이 돼야 한다. 확실한 것은 이번 개정이 회계 업계는 물론이고 재계·중소기업계의 ‘효능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점이다. 회계 정보 생산의 핵심 주체는 결국 기업이기 때문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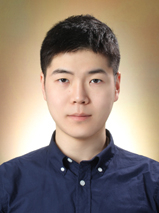
 vita@sedaily.com
vit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