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괴할 정도로 살찐 사람들이 자동차 비슷한 유선형 공간에 앉아 허공의 격자망을 따라 실려 다닌다. 마침내 주위에 신경 써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거대한 컵에 담긴 것을 후루룩 들이마시고는 넋을 놓고 스크린을 응시한다. 더 이상 세상의 과잉결정에 시달리지 않는다. 그들의 얼굴은 진기한 구경거리들의 아편 같은 즐거움에 나른해진 듯 밝게 빛난다.”
미래사회의 쓰레기 청소 로봇을 주인공으로 한 디즈니 애니메이션 ‘월-E’(2008)의 한 장면을 묘사한 저자는 이렇게 덧붙인다. “이 존재들은 완벽하게 안전하고 만족한 상태이고, 어째선지 인간에 못 미친다.”
미국의 정치철학자이면서 모터사이클 수리점을 운영하는 독특한 취미의 저자 매슈 크로퍼드의 책 ‘운전하는 철학자’가 번역 출간됐다. 원제는 ‘Why we drive’. 우리는 왜 운전하는가로 직역될 제목을 대신해 ‘운전이 어떻게 우리를 인간답게 하는가’라는 부제가 달렸다.
반복되는 출퇴근 시간의 교통체증과 불필요한 번거로움에서 벗어나게 할 ‘자율주행’이 꿈같은 미래로 소개되고 있지만 저자는 반대로 “휴식의 모든 순간들이 ‘기회비용’이라는 가차없는 논리 앞에 정당화돼야 하는 사회에서 출퇴근을 위한 운전은 어쩌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진짜 안식일지 모른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그는 좁고 구불거리며 아슬아슬하기 짝이 없는 길을 도전하듯 달리며 “신념의 도약”을 되새기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음에도 “존재론적으로 정당화되었다”는 기분을 느낀다고 밝혔다. 단지 그의 개인적 취향 때문일까?
저자는 ‘운전’을 단순한 이동을 위한 행위로 보지 않는다. 운전은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수많은 판단과 움직임을 필요로 한다. 발로 페달을 밟고 손으로 운전대를 돌리는 등 몸으로 하는 인간적 행위다. 특히 저자는 운전을 도덕적 판단 유발의 기제로 봤다. 운전을 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에 “사회적 신뢰 회복에 대한 우리의 희망을 더 폭넓게 이끌 수 있는 단서”라는 점에서 ‘인간다운’ 행위가 된다. 자율주행차의 등장으로 인간이 더 이상 운전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 차에 탄 인간은 ‘도로 위의 주권을 지닌 시민’에서 단순한 승객으로 전락한다.
“여러 디스토피아적 영화에서 자율주행차의 운전자는 승객이 되어, 새로운 등급의 관리 대상인 행정적 신민처럼 보인다. 승객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초연하고 고립돼 있는 반면, 도시에서 운전이라는 행위는 협력과 임기응변의 기술을 요하는 상호작용의 영역이다.”
이 책에 몰입하다 보면 걸으며 철학했던 프리드리히 니체, 산책을 즐긴 몽상가 장 자크 루소, 파리의 아케이드를 오가며 자본주의를 연구한 발터 벤야민 등이 떠오른다. 걸으며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장악했던 이들은 저마다의 사상적 성과를 이뤘다면, 저자 크로퍼드는 이를 확장해 ‘휴머니즘으로서의 운전’을 이야기 한다. 공공재로서의 도로를 공유하는 인간 상호의 신뢰와 연대, 운전자의 윤리의식에 대한 저자의 분석은 현학적 어휘 대신 실질적 경험과 사례에 기반한다. 영아기의 기억이 떠오르지 않는 이유가 자율적 이동이 기억 능력을 발달시키고 뇌의 인지지도를 심화한다는 가설도 흥미롭다.
핵심은 운전 행위로 주체성을 갖는 인간의 주권이다. 자율주행 시대를 위해 선행되는 과도한 정보수집과 그것이 유발할 관리와 통제, 기업들의 횡포와 공권력의 개입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 이유다. 저자는 이를 ‘구글의 거리 뷰’와 ‘구글이 자동차를 만든다면’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근대기의 도시 산책자 ‘플라뇌르’가 있었다면 지금은 운전하며 나서는 ‘방랑자’가 필요한 듯하다. 저자는 “매일같이 일상의 숱한 영역들이 타의에 의해 관리되고 맥없이 진압당하는 상황"인 우리의 현실을 들추며 ‘운전’은 단순히 두 지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동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느슨한 해방의 순간’으로 이끄는 휴머니즘으로서의 운전임을 강조한다. ‘운전’을 화두로 삼았을 뿐 책의 속내는 민주주의 실현을 지향하는 정치철학서다. “민주주의 (사회는)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능력이 있는 개인들로 구성돼야 하고, 동료 시민의 신뢰를 얻어 마땅하다. 오토바이를 타고 2차선 시골길의 보이지 않는 커브에 접어들 때 도로는 상호신뢰의 장소임이 아주 분명해진다. 이것이 운전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 중 하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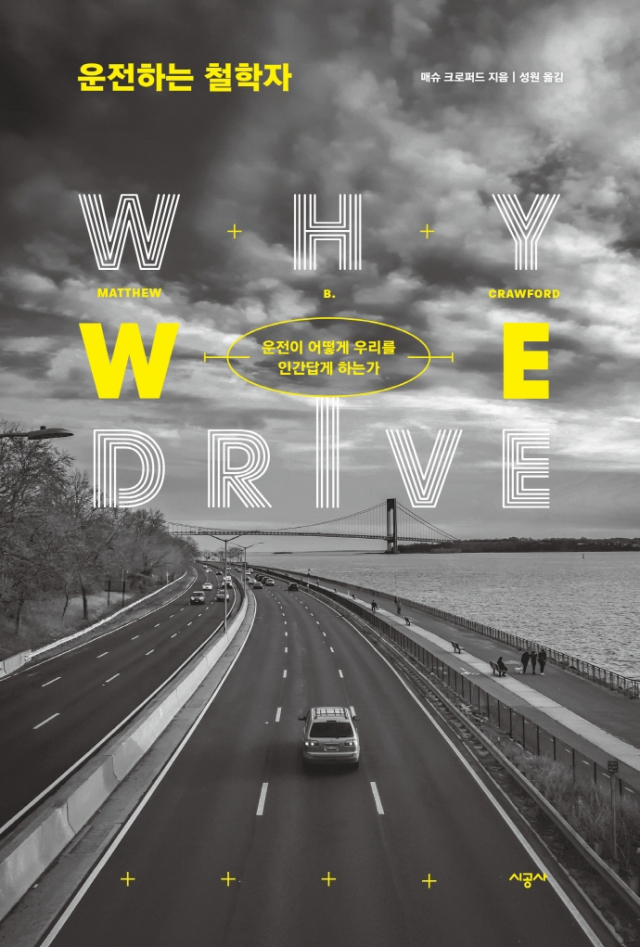

 ccsi@sedaily.com
ccsi@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