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은 종종 투쟁한다. 직설적이지 않은 예술 언어는 권력과 폭력을 휘두르지 않고도 강렬한 힘을 발휘한다.
리움미술관 안뜰의 설치작품 ‘큰 나무와 눈’으로 친숙하고, 시카고·런던·뉴욕 등 주요 도시의 공공미술로도 유명한 예술가 아니쉬 카푸어는 2017년에 포스터 하나를 제작했다. 자신을 찍은 반전(反轉) 흑백사진에, 나치 선전문구 같은 글씨체로 ‘나는 미국을 좋아하지만 미국은 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라고 적었다. 독일 개념미술가 요셉 보이스의 1974년 퍼포먼스 ‘나는 미국을 좋아하고 미국도 나를 좋아합니다’를 떠올리게 하는 문구다. 인도 태생의 영국 미술가인 카푸어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취임 열흘째부터 무슬림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시키자 이같은 포스터로 항의했다. “침묵은 배타적인 정치 움직임에 동조하는 것. 절대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던 카푸어는 조 리폰의 새 책 ‘저항의 예술’ 서문에서 고야·피카소·브루게라부터 아이웨이웨이까지 거론하며 “수많은 예술가들이 대중을 억압하는 힘에 대항하고자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책은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작품집”이라고 밝혔다.
전쟁으로 실제 자식을 잃기도 한 독일의 예술가 케테 콜비츠는 검은 목탄화로 세 아이를 안은 엄마와 부상자, 노인들을 그린 포스터에서 ‘전쟁을 향한 전쟁!’(1923)을 외쳤다.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자연파괴의 참상 이후 1970년 제정된 ‘지구의 날’의 첫 포스터는 미국 화가이자 환경운동가였던 로버트 라우션버그가 맡았다. 오염된 도시와 황량한 풍경 등을 작가 특유의 기법으로 배치한 후 한가운데 미국을 상징함에도 멸종위기에 처해있던 흰머리수리를 붙였다. 이름난 예술가들의 포스터는 작가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지만, 이름을 남기지 않은 ‘무명의 예술가’가 제작한 포스터도 울림의 강도는 만만치 않다.
책은 △난민 △기후변화 △페미니즘 △인종차별 △LGBTQ(성소수자차별) △전쟁과 핵무기 반대 등 7개 이슈에 대한 지난 100년간의 포스터 140여 개를 담은 화보집이다. 국제앰네스티가 협력기획으로 참여해 포스터 선정에 함께 했다.
책 속 가장 오래된 포스터는 1904년 미국 서부광부연맹이 제작한 ‘콜로라도는 과연 미국인가?’. 성조기를 배경으로, 노동자 인권 유린의 상황을 적어 고발했다. 광산주와 정부 측의 일방통행적 법 집행을 비판한 것임에도 법원은 ‘성조기에 대한 모독 행위’를 문제 삼았고 뜨거운 논쟁을 일으켰다.
1908년 영국에서 제작된 ‘나팔수 소녀’ 포스터는 여성 참정권 운동의 상징적 이미지가 됐다. 평등을 주장한 그 존엄한 권리는 100년이 지나 아프가니스탄 망명 소녀를 주인공으로 미국 사진작가 스티브 맥커리가 찍은 사진이 사용된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권리’(2010) 포스터에서도 목소리를 낸다. 유엔여성기구의 의뢰로 미맥 오길비 앤 매더 두바이가 2013년에 제작한 여성인권에 관한 포스터는 실제 구글 검색에서 ‘여성은…해야한다(Women should)’를 입력하면 자동완성 기능으로 제시되는 문구들을 그대로 보여줬다. 성차별적 발언과 노골적 욕설이 만연한 남녀 불평등이 100년이 지나도 그리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음을 강력하게 드러냈다. 3만5000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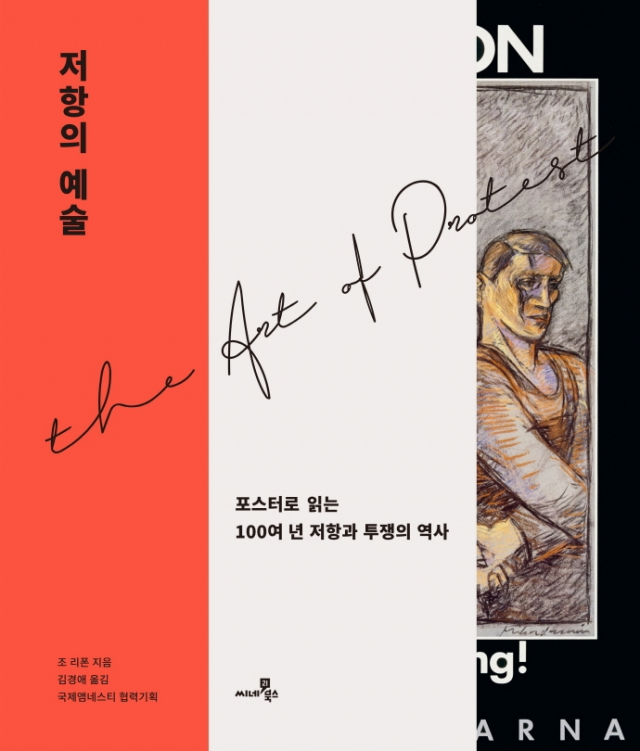

 ccsi@sedaily.com
ccsi@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