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안으로 주식시장이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올해 기업공개(IPO)를 통한 자금 조달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개점 휴업’ 상태는 올해 내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22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금융 정보 업체 딜로직 조사 결과 올해 들어 IPO를 통한 자금 조달 규모가 51억 달러(약 6조 8000억 원)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섰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 수준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증시가 활황을 보였던 지난해를 제외하더라도 8월 초까지 IPO를 통한 자금 조달 규모는 평균적으로 330억 달러 수준에 달했다.
이는 IPO 시장이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에 버금가는 ‘혹한기’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연말에 IPO가 재개됐던 2009년 당시와 달리 올해는 갈수록 더해지는 경기 악화 우려 속에 후반기에도 시장이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장을 준비했던 많은 기업이 기업가치를 대폭 낮춰 투자를 끌어모으는가 하면 감원과 비용 감축으로 간신히 자금난을 견디고 있다. 올해 상장을 예정했던 후불 결제 서비스 업체 클라나는 기업가치를 67억 달러로 85%가량 낮추고 기존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식료품 배달 업체 인스타카트도 최근 전년 대비 절반 수준인 240억 달러의 기업가치로 추가 투자를 유치했다. 마이크로모빌리티 업체인 라임이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스톡엑스 등은 올해 목표했던 IPO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IPO를 강행한 기업들의 성과도 좋지 않다. 올 5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의료기기 업체 바슈롬은 시장의 무관심 속에 예상했던 공모가보다 25%가량 낮춘 공모가로 상장했다. 배럿 대니얼스 딜로이트 미국 IPO 총괄은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기대를 밑도는 기업가치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며 현 상황에서 IPO를 선택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했다. IPO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예정됐던 IPO가 대부분 물 건너갔거나 일부는 내년을 노리고 있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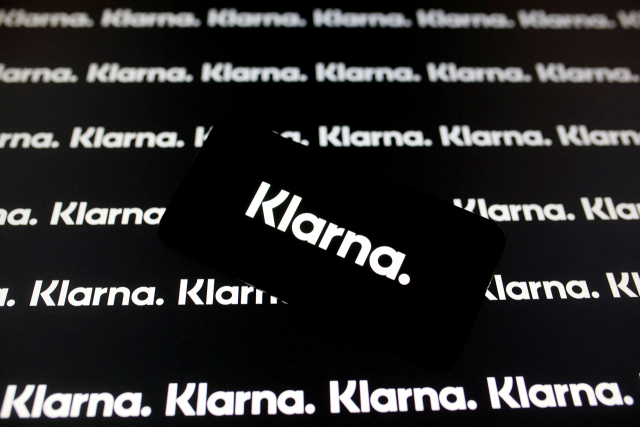
 madein@sedaily.com
made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