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을 비롯한 동물 종들은 선택할 수만 있다면 맛있는 것을 선호한다.”
불현듯 떠오른 이 생각을 저자들은 ‘급진적’이라고 여겼다. 당연한 듯 한데도 지금껏 거의 간과됐던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자며 생태학자이자 진화생물학자인 롭 던과 인류학자인 모니카 산체스가 의기투합했다. 둘은 신간 ‘딜리셔스’의 부부 저자다. 이들은 호모 사피엔스란 바로 ‘맛보는(sapiens) 사람(Homo)’이라는 생각에서 진화와 역사를 바라봤다.
대략 600만 년 전에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한 인류는 더욱 풍미 가득한 맛있는 먹거리를 찾아내고, 발견하고, 먹을 방법을 추구했다는 것이 저자들의 가설이다. 책은 “향미와 요리의 전통은 이후 주요한 진화적 변화를 촉발한 도구의 출현에 핵심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좀 더 맛있는 먹거리를 얻을 수 있게끔 도구를 발전시킨 것이 진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다. 나아가 “맛있는 먹거리로부터 얻은 영양분과 에너지는 인류 조상들의 진화 궤적을 바꾸는” 데 일조했다. 인간의 머릿속에서 일어난 진화, 즉 뇌의 발달이 향미의 한 부분으로서 입에서 감지된 향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했다는 점도 짚어 본다.
맛있는 것을 찾고자 한 인간의 본능이 때로는 몇몇 동물의 멸종을 부르기도 했다. “매머드의 발은 특히 맛있었던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맛볼 기회가 없다”는 저자는 고대 수렵·채집인들이 먹잇감으로 선호했던 약 1.5m 크기의 거대 올빼미가 사라졌고, 작은 코끼리, 거대한 땅나무늘보, 포식성 캥거루 등 수많은 종들이 종적을 감춘 사연들을 풀어 놓는다. 어쩌면 상대적으로 사냥이 용이한 짐승들이었을 지도 모를 일이지만 말이다.
반면 열매들은 인간의 입맛이 아니라 지금은 멸종된 동물들의 입을 즐겁게 해주는 방향으로 진화한 것들이 많다. 그래야 먹히지 않기 때문이다. 향미를 추구하는 본능은 향신료 사용과 발효음식으로도 이어진다. 감각기관 중 눈과 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게 일반론이지만 향신료나 발효와 관련한 선택의 순간에는 코와 입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만들기 쉽고 영양도 풍부한데 굳이 복잡하고 노동집약적인 음식을 만드는 이유에서도 향미가 등장한다. 저자들은 수도승 집단의 특정한 환경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이들이 유럽 음식 변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봤다. 음식에 대한 새로운 통찰인 책을 통해 맛있는 음식이 주는 행복과 충만감이 우리를 얼마나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된다. 1만8000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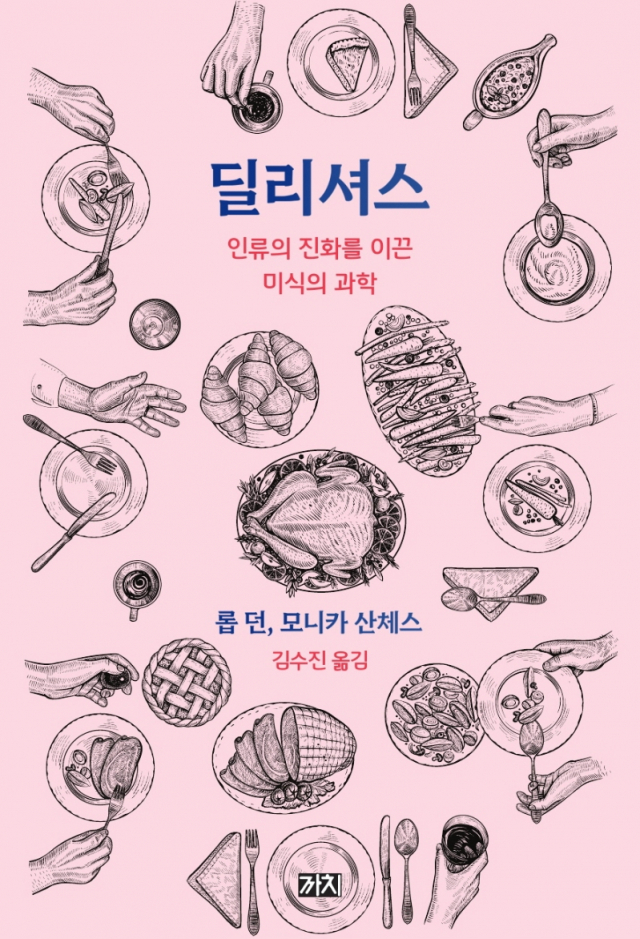

 ccsi@sedaily.com
ccsi@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