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면 한국전력발(發) 금융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한전은 올해와 엇비슷한(30조 원대) 적자를 기록할 겁니다. (22일 한전채 발행 한도를 다섯 배 이상 늘린)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앞으로 채권시장에 쏟아지는 한전채 물량을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는 사태까지 갈 수 있어요. 해답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처럼 ‘자이언트스텝(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예고하고 단행한 것을 원용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국민에게 솔직하게)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알리고 이를 실현해야 합니다.”
23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에너지전략포럼’ 주제 강연을 맡은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의 강연은 호소에 가까웠다. 그만큼 전력을 공급하는 한전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파국을 막으려면 전기요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손 교수의 진단이다. 손 교수는 “요금 인상 없이는 전력 소비가 줄지 않아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며 “인상 폭을 최소 50%로 잡는 등 충격요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가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만이 해법이라고 보는 것은 에너지 위기가 최소 4~5년은 더 간다고 보기 때문이다. 탄소 중립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열풍으로 2015년부터 7~8년간 화석연료 관련 투자가 급감했고 그 여파가 에너지 위기로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손 교수는 “에너지 위기의 근본에는 전 세계적인 화석연료에 대한 혐오가 있다”며 “그 결과 7~8년간 투자 공백이 컸고 그 규모는 최소 2조 달러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석유 탐사·생산, 석탄 설비투자가 증발한 반면 에너지 수요는 전혀 줄지 않았다”며 “지금 세계 각국이 에너지 설비투자에 부랴부랴 나섰지만 이들 프로젝트가 결실을 맺는 데까지는 최소 4~5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혹여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도 에너지 가격의 안정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특히 탈원전 정책이 위기에 기름을 부었다는 입장이다. 손 교수는 “2015년 수립한 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금 71.6GW의 기저설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탈원전 정책과 화력발전소 폐쇄로 지난해 기준 기저설비가 60.6GW 불과하다”며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의 문을 닫고 지어져야 하는 신한울 1·2·3·4호기를 늦게 짓거나 시작도 못하며 11GW의 기저설비가 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운이 나쁘게도 탈원전의 후유증이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는 에너지 위기 시점과 맞물려 왔다”며 “기저설비가 사라진 결과 엄청난 돈을 천연가스 발전에 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게 됐는데, 이것이 탈원전의 가장 심각한 폐해”라고 짚었다. 유럽의 에너지 충격이 아시아로 전이되면서 액화천연가스(LNG)를 두고 유럽과 아시아가 경쟁하는 상황이라 앞으로 천연가스 가격은 고공 행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손 교수는 “지난해만 해도 에너지 관련 모임의 모든 주제가 탄소 중립이었지만 1년 사이에 완전히 바뀌었다”며 “천연가스 발전원가의 75%가 에너지 비용인 반면 원자력발전에서 우라늄 구입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5%로 에너지 위기에 가장 강한 게 원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 위기 극복에는 절제와 고통이 따른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유권자 표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 때문에 전기료를 못 올린다는 식의 접근은 한전이 버티기 어려워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과 블랙아웃(대규모 정전) 사태 중 어느 것이 기회비용이 적은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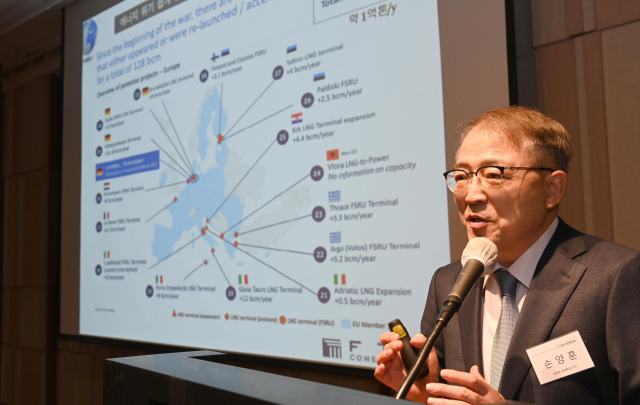
 tak@sedaily.com
ta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