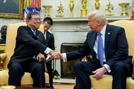이창용(사진)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가계부채가 중장기적으로 상당한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가계부채가 2000년대 초반 카드 사태 이후 한 번의 디레버리징 과정도 없이 급격히 늘어난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이 총재는 ‘물가안정목표 운영 상황 점검’ 기자 간담회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가계부채 대응을 “외과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보면서 약을 더 써도 되는지, 아니면 위험한지 등을 판단하면서 조정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비유했다. 그는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데 급격히 디레버리징을 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것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다만 금리만으로 부채를 줄일 수 없고 분양 제도를 포함한 제도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디레버리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금리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주택금융의 구조적 형태와 고정·변동금리, 선·후분양 문제 등이 모두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은은 국내외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물가 오름세도 점차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국제유가 반등,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 폭 확대와 같은 상방 리스크와 국내외 경기 둔화 등 하방 리스크가 뒤섞여 있는 만큼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까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한은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6%로 예상했는데 지난달 전망 때보다 국제유가는 더 떨어진 반면 공공요금 인상 폭은 확대돼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총재는 “중장기적으로 물가를 2%에 수렴하는 것이 한은의 책무(mandate)”라며 “내년 중 물가 상승률이 점차 낮아지더라도 물가안정목표인 2%를 넘는 만큼 물가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 운영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공개한 최종금리 3.5% 수준에 대해서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며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총재는 “지난달 다수의 금통위원이 최종금리 3.5%이면 과소 대응도 아니고 과잉 대응도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경제 상황이 바뀌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며 “정책에 대한 약속으로 이해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w@sedaily.com
j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