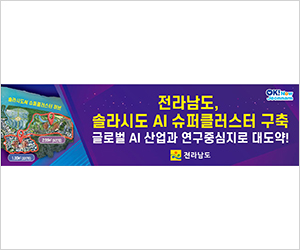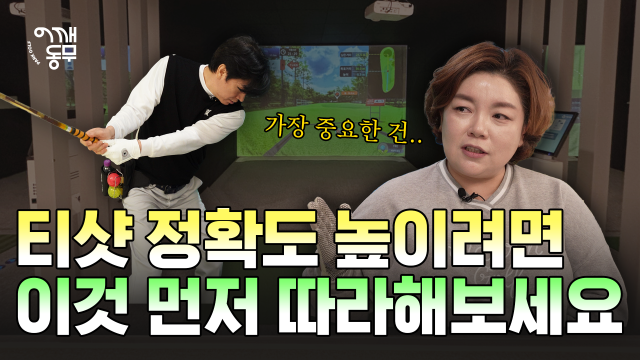“농자재비랑 인건비가 배로 뛰어서 빚쟁이가 된 농가들이 수두룩합니다. 계약재배가 아니면 저희도 살아남기 어려워요.”
KGC인삼공사에 인삼을 납품하는 한 농민이 한 말이다. 그는 대부분의 농가들이 KT&G로부터 인삼공사의 독립을 반대한다고 전했다.
인삼 농사는 인내심을 많이 요구한다. 인삼을 6년이나 땅에 묵혀야 완숙하고 영양분이 풍부해진다. 재배 조건이 까다로워 재배지 선정부터 토양 관리까지 2년을 더 준비해야 한다. 인삼공사는 경작 지원금, 무이자 대출 등으로 농가의 리스크를 직접 떠안고 있다. 연간 4000억 원가량 규모인데 모회사의 자본력이 없다면 선뜻 이뤄지기 힘든 사업 전략이다. 인삼공사는 건강기능‘식품’을 팔지만 제약회사 못지않게 고정비용이 크다.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인삼공사와 농가의 신뢰관계 덕에 한국 인삼은 해외에서도 선전하고 있다. 인삼공사의 해외 매출 비중은 2020년 처음 10%를 넘어선 뒤 계속 상승 중인데 특히 중국 매출이 성장의 대부분을 견인하고 있다. 중국은 인삼을 재배 연도별로 구분해 일반 식품, 보건 식품으로 나눌 정도로 인삼 장기 재배에 관심이 많다.
행동주의펀드를 표방하는 FCP는 KT&G 주주총회를 앞두고 연일 인적 분할 공세를 퍼붓고 있다. FCP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강조하며 경영진에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기업을 잘 성장시켜 주주들에게도 실현 이익을 나눠주자”는 취지인데 놓친 게 하나 있다. 기업의 주인은 주주이지만, 직원과 내·외부 거래자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노력 없이는 성장이 어렵다. ESG의 거버넌스(G)는 이해관계자들이 꾸준히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지속 가능성의 관점도 포함한다.
FCP가 인내심을 갖고 농가의 시간을 기다려줄지는 의문이다. 사모펀드는 언젠가는 기업을 비싼 가격에 팔아서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안겨줘야 하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인삼공사가 FCP의 이상대로 잘 성장한다고 해도 나중에는 어디로 팔릴지, 그간의 혼란으로 인한 기회비용은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aaangs10@sedaily.com
kaaangs1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