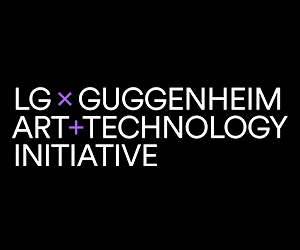정부가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를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신고제’를 추진한다. 비대면 진료에서 플랫폼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업계에서도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비대면 진료 재진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비대면 플랫폼 신고제 등의 내용을 담은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 정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별도 심사 절차 없이 플랫폼 운영이 가능해진다.
정부안은 비대면 진료에서 사실상 플랫폼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특히 요건만 갖추면 승인해주는 가장 낮은 수준의 단계인 ‘신고’인 만큼 플랫폼 업계에서도 반기는 분위기다. 플랫폼 업계의 한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라는 체계 안에 플랫폼이 공식적으로 포함되는 것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의견서에는 앞서 논의된 허가제’ 등이 일정 부분 반영됐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며 약사법 위반 등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허가제를 제시한 바 있다. 허가제를 도입해 플랫폼 기업들의 전문의약품 불법 광고 등을 정부 차원에서 보다 원활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의견서에는 허가보다 신고로 허들을 낮췄다.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플랫폼의 역할을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여전히 비대면 진료는 재진이라는 원칙 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예외적으로 초진이 허용되는 범위를 기존 시범 사업 대비 확장했다. 시범 사업에서는 섬·벽지 환자, 노인·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에 한해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의 이용이 가능했다면 이번 정부 안에서는 재외국민·교정 시설 이용자가 추가됐다.
국회는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정부가 제안한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 두고 정부가 재진 원칙을 고수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나왔다. 비대면 진료를 재진부터 허용함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기 위해서 먼저 병원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이다. 직장·학교 등을 다니며 병원을 방문할 시간이 없는 이용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더욱 이용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con_jun@sedaily.com
econ_j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