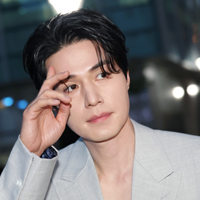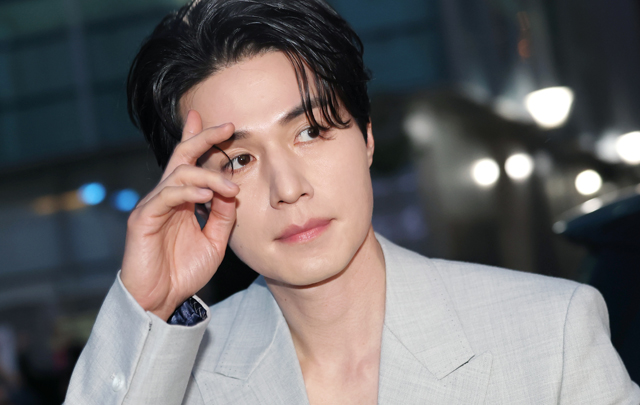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고금리 장기화를 시사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와 같은 저금리 환경이 돌아오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 변화로 고금리가 오래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가계·기업·정부 모두 부채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자본시장연구원이 개최한 ‘금리 기조의 구조적 전환 가능성과 민간 부채’ 콘퍼런스에 참석해 “미국 경제가 향후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주요 선진국 국가부채가 확대되고 세계화가 후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글로벌 금리는 과거와 같은 저금리 수준으로 복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제적인 고금리 기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도 가파른 인구 고령화 등으로 실질 중립금리가 낮은 수준에서 횡보하는 가운데 노동 가능 인구 부족 등으로 추세 물가가 상승하면서 금리를 큰 폭으로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 추세 물가는 경기 순환적 요인을 배제한 물가상승률의 장기 추세를 말한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금리 기조가 과거와 같은 저금리 수준으로 복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문제는 가계부채가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할 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속도도 빠르다는 것이다. 고금리 여건이 장기화할수록 소비 둔화로 경기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부실도 늘어날 수 있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날 위험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 정책 신뢰성을 확보해 과도한 가격 상승 기대를 억제하는 등 부동산 관련 레버리지 확대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노력과 함께 금리 리스크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특히 가계부채가 잠재적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되는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 역시 “팬데믹 이전 초저금리 추세로 복귀하는 것은 편익보다 비용이 더 크다”며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w@sedaily.com
j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