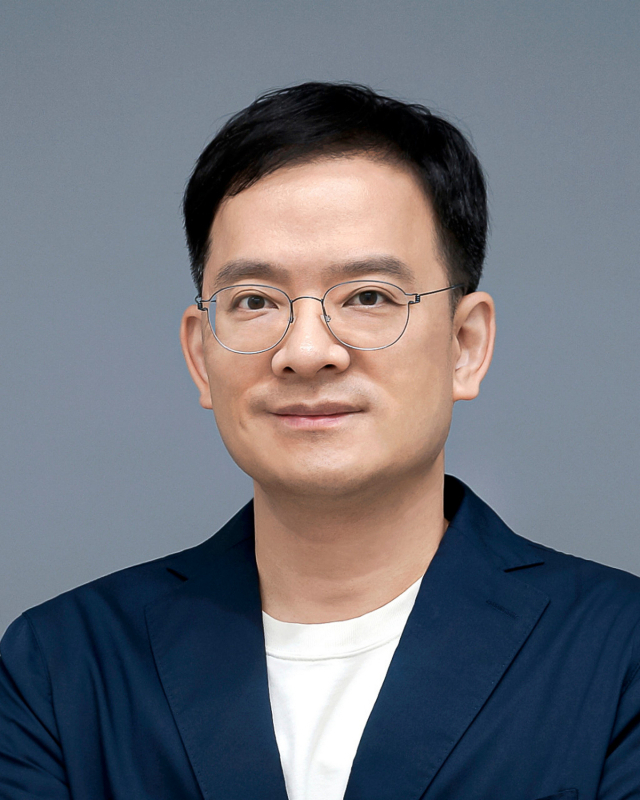몇 년 전 ‘토이 스토리’로 유명한 애니메이션 제작사 픽사스튜디오를 방문한 적이 있다. 본관 입구에 놓여 있는 아카데미 트로피들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본관의 구조였다. 애플에서 쫓겨난 후 픽사를 인수한 스티브 잡스는 건물 왼쪽에는 좌뇌에 해당하는 프로그래머, 오른쪽에는 우뇌에 해당하는 작가와 애니메이터 등이 근무하게 했다. 서로 업무 스타일이 다른 직군끼리 떨어뜨려 놓으면서도 식당과 화장실을 가운데 배치해 수시로 무조건 만나게 했다. 픽사스튜디오는 수학과 창의, 과학기술과 스토리가 공존하는 곳이었다. 실리콘밸리와 할리우드를 한꺼번에 본 느낌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실리콘밸리와 할리우드가 처음으로 크게 충돌했다. 오픈AI가 가져온 생성형 인공지능(AI) 돌풍 때문이다. AI가 바둑만 잘 두는 줄 알았는데 창작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작가나 배우들은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느꼈다. 먼저 미국작가조합이 들고일어났다. AI가 자신들이 피땀 흘려 써내려 간 글을 학습해 자신의 것인 양 글쓰기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할리우드 스튜디오는 대본 작성에 AI 사용을 제한하기로 작가조합과 합의했다. 그 다음으로 배우들이 들고일어났다. AI를 사용한 배우 연기 대체를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할리우드가 오픈AI의 챗GPT에 맞서 가장 먼저 들고일어난 셈이다.
할리우드 작가나 배우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AI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다 없앨까. 꼭 그렇게 보기만은 어렵다. 로알드 달의 소설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이전 이야기 격인 영화 ‘웡카’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작품이다. 스토리와 연기·음악도 탄탄하지만 특히 환상적인 세트장이 대단했다. 세트 디자인을 총괄한 네이선 크롤리는 유럽 여러 나라들을 돌아본 후 각국의 장점들을 혼합해 10m 높이의 세트장을 만들었다. 흥미로운 것은 세트장을 만들 때 스케치 후 AI로 미리 시뮬레이션을 하며 시행착오를 줄였다는 점이다. 인간의 빈틈을 AI가 메워주는 협업 관계가 가능함을 보여준 예다.
필자의 회사도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업무 효율을 높여주는 AI 소프트웨어를 공급한다. 대규모 정보기술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금융권과 공공기관은 365일 중단 없는 서비스가 최고의 목표다. 그런데 워낙 시스템이 방대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면 수많은 운영 인력들이 원인 탐지와 분석을 하느라 꽤 많은 시간을 쓴다. 정부와 공공기관·기업들이 전산 시스템 먹통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람의 힘만으로 문제 원인을 밝히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서비스 이용을 못 하는 사이 신뢰는 추락하니 AI 솔루션 도입을 통한 이상 예측이나 문제 원인 탐지·분석은 필수적이다. 이때 AI는 시스템 운영 인력을 대체하지 않는다. 그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도와준다.
이처럼 결국 AI도 인간과 함께 발전해나갈 수밖에 없다. 처음부터 인간의 직업을 없애기 위해 만든 AI 제품은 상당한 저항에 부딪히겠지만 인간의 빈틈을 채워주는 AI는 크게 환영받을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대화형 인공지능 이름이 ‘코파일럿(Copilot·부기장)’인 것도 조종은 인간이 하고 AI는 옆에서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이다. 막연한 공포에서 벗어나 우리가 직접 해야 할 일과 AI의 도움을 받아야 할 일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AI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우리 일의 중심을 잡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된다. AI가 인간의 빈틈을 메워준다면 인간은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다. AI는 우리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파트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AI를 미워하지 않을 용기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