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 만 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는 호황을 구가했던 울산. 조선·자동차·석유화학 등 3대 산업이 도시를 키웠고 풍부한 일자리에 노동자 중산층의 희망이 살아 숨 쉬던 곳이었다. 그러던 울산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고 낙관주의는 비관주의에 자리를 내주고 있다. 울산의 현실은 제조업과 수출을 통해 성장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이기도 하다. 울산을 바꿀 수 있으면 한국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신간 ‘울산 디스토피아, 제조업 강국의 불안한 미래’는 저자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가 울산의 산업화 역사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조망한 책이다.
울산은 일제강점기 후반 일본과 만주를 연결하는 병참기지로 계획된 데 이어 196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중추로서 제조업 기지로 본격 육성됐다. 정주영 등 혁신적인 기업가가 앞장서고 노동자가 모이고 기술개발이 이어지면서 주력인 조선·자동차·석유화학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까지 도약했다. 이를 통해 울산의 지역내총생산은 전국 1위이기도 하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 속에 울산의 강점이 흔들리고 있다. 글로벌 위기를 주기적으로 겪으며 2010년대 구조조정 한파에서 호시절은 끝났다. 2015년을 정점으로 도시인구는 계속 감소하는 중이다. 생산현장에서는 정규직 원청 채용 대신 하청과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싼 외국인 노동자들도 유입되고 있다.
기술 혁신의 주역인 엔지니어링 센터는 우수 인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전하면서 울산은 과거 ‘산업도시’의 영광을 잃고 ‘생산기지’로 전락하고 있다. 머리 역할은 다른 지역에서 하고 대체가능한 팔다리만 울산에 남아 있다는 의미다.
게다가 지역 대학은 지역 산업을 뒷받침할 인재 공급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들도 일자리를 찾아 서울 등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중이다.
그러나 아직 희망을 버리긴 이르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제조업 역량이 건재하다는 점, 자동화에 대체되지 않은 노동자들의 노하우가 있다는 점, 대학들이 여전히 많은 공학도를 배출하고 있다는 점 등이 그 희망의 증표다. 울산이라는 지정학적 위치의 우월성도 그대로다.
점차 서비스업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울산에서 보듯 여전히 제조업이 한국의 미래 산업으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1만 9800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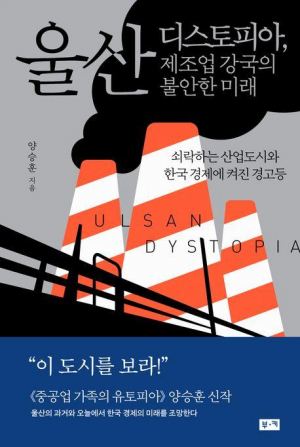
 chsm@sedaily.com
chs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