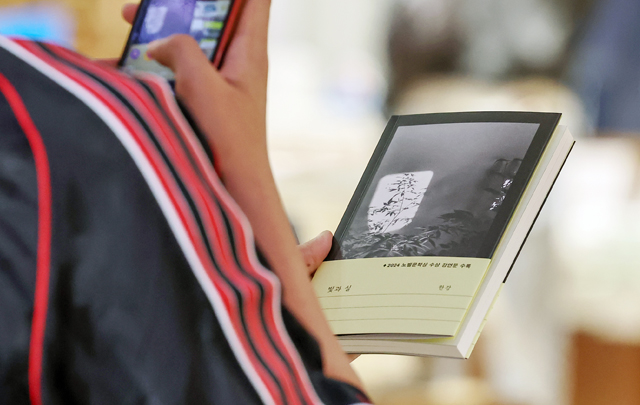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우리나라 미래 먹을거리인 인공지능(AI) 육성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AI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수십조 단위의 자본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는 게 상식이 되면서 정부와 민간의 ‘원팀’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국내 1등 기업들도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미국이나 중국과는 도저히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5000억 달러(720조 원) 규모의 AI 인프라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를 발표하고 중국·유럽연합(EU) 등과의 AI 패권 경쟁에 불을 붙였다. 프랑스 역시 10~11일(현지 시간) 파리에서 열리는 AI 행동 정상회의를 앞두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1090억 유로(163조 원)의 투자 유치 계획을 깜짝 공개하는 등 맞불을 놓았지만 한국은 리더십 공백 속에 사실상 손놓고 있다.
경쟁 국가에 비하면 한국의 AI 예산은 민망한 수준이다. 올해 673조 3000억 원의 정부 예산 중 AI 관련은 전체의 0.27%인 1조 8000억 원에 그친다. 이는 중국의 1917억 위안(약 39조 원, 0.68%), 미국의 200억 달러(약 29조 원, 0.27%)와 비교해 턱없이 적은 액수다. 민간투자는 더 차이가 난다. 미국 스탠퍼드대의 ‘AI 인덱스 2024’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민간투자액은 13억 9000만 달러로 세계 9위에 머무른다. 미국(672억 2000만 달러)과 중국(77억 6000만 달러)은 물론 3위권인 영국(37억 8000만 달러)·독일(19억 1000만 달러)에도 크게 뒤진다.
AI는 그 어떤 산업보다도 투자의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하지만 AI시대의 소총이자 실탄 격인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전에서도 이미 밀리고 있는 게 한국의 현실이다. 우리나라가 확보한 GPU는 H100 기준 2000여 개로 메타(35만 개), 테슬라(3만 5000개), 아마존웹서비스(AWS·3만 개), 구글(2만 6000개) 등 글로벌 기술 기업(빅테크)에 미치지 못한다.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한국의 AI 기술 역량은 세계 6위 수준, AI 인재 역량도 10위권으로 평가된다”면서도 “한국의 AI 활용도가 20위 권에 들지 못하는 데다 강대국이 주도하는 AI 패권 경쟁의 파도를 헤쳐나갈 국가 책략을 마련하려는 종합적인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가 총력전으로 펼쳐지고 있는 AI 투자 경쟁은 올 들어 한층 격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오픈AI·소프트뱅크·오라클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AI 데이터센터 구축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띄우기에 나섰다. 일본 소프트뱅크는 오픈AI에 400억 달러(약58조 원) 규모의 투자를 검토 중이며 오픈AI는 이를 재원으로 애리조나·캘리포니아·플로리다·루이지애나·메릴랜드·네바다·뉴욕 등 미국 내 16개 주에 데이터센터 건설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한국은 경쟁력에서 밀리는 것은 물론이고 발이 묶여 있다. 지난해 12월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감액 예산안’에는 AI 관련 예산이 다수 삭감되거나 증액이 백지화됐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상임 장관이 즉각 “AI 컴퓨팅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국내외 수준 높은 인력을 유치하는 데 추경이 쓰였으면 좋겠다”고 호소한 이유다.
그나마 중국 딥시크발 충격에 놀란 여야가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당 내 AI 추경에 가장 적극적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대 10조 원 규모의 AI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AI 민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AI 전환 촉진기금’ 설립과 AI 선도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 및 금융 지원 등 ‘AI 혁신 이니셔티브’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I의 확산은 장기 저성장의 초입에 들어선 한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이날 “AI 기술의 도입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을 2050년까지 최대 12.6% 높일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한은에 따르면 AI가 노동력을 보완하고 전반적인 생산성을 증대시킨다는 긍정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총요소생산성이 3.2%, GDP는 12.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bc@sedaily.com
ab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