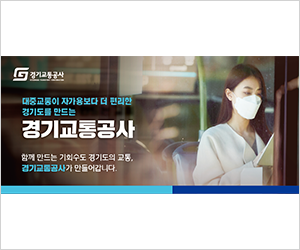“신규 대출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은행들의 대출금리가 적절한 수준인지 점검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 만인 21일, 금융감독 당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1일 은행 20곳에 공문을 보내 차주·상품별로 준거·가산금리 변동 내역과 근거, 우대금리 적용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의 판단은 금융위와 같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과 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총 0.5%포인트를 내렸지만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해 12월 평균 가계대출 금리는 연 4.57~5.17%로 금리 인하 전인 9월(4.04~4.47%) 대비 되레 상승했다.
실제로 4대 금융그룹의 지난해 이자 이익은 41조 8760억 원에 달한다. 천문학적인 이자 이익을 바탕으로 4대 지주는 지난 한 해에만 무려 16조 4205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관치의 우산 아래 누워서 헤엄 치기 식으로 영업을 하는 국내 은행들은 분명히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다. 해외 진출이나 투자은행(IB) 업무보다 국내에서 손쉽게 이자 장사를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16조 원이 넘는 순이익의 반대편에 있는 자영업자들과 서민들의 눈물을 기억해야 한다.
다만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 국내 은행들이 지난해 예대 마진을 늘리고 가산금리를 높인 것은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막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1분기 마이너스였던 가계대출 추이는 2분기 들어 4조~5조 원으로 불어나더니 8월에는 9조 7000억 원까지 치솟았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은 선제적 기준금리 인하를 못 했다. 결국 당국은 대출을 줄이라고 압박했고 은행들은 금리 인상으로 대응했다. 금감원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스스로 가산금리를 올려 조 단위 이익을 내려고 시도하는 간 큰 은행은 한 곳도 없다.
문제는 정부가 가계부채 폭증을 불러온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로 예정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돌연 두 달이나 연기하면서 대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쏟아졌다. 은행의 이자 장사를 지적하려면 그 전에 왜 은행들이 금리를 올려 가계부채를 막아야 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김 위원장은 “은행들이 8~9월에 신규 대출금리를 올려서 대응을 했고 저희가 그건 아니다 싶어서 심사를 강화하라고 했다”고 했지만 심사를 강화하면 대출을 못 받는 사람이 생기거나 금액이 줄게 된다. 말이 좋아 심사 강화지 사실상 대출 총량을 줄이는 것과 다름없다. 당국이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을 지적하려면 그 전에 DSR 정책 실기부터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seop@sedaily.com
jseo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