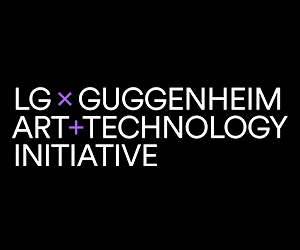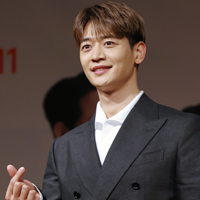미국이 베트남에 무려 46%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베트남을 미국향 수출 제품의 생산 거점으로 삼아온 중소기업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46%의 관세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중국에 비해 베트남이 전초 기지로 경쟁력이 있다는 의견과 이제는 미국 생산량을 늘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중국, 베트남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는 스마트폰 부품사 A사는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율 발표직 후 수출 전략을 새로 짜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우리가 공급하는 부품이 스마트폰에만 쓰이진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 산업이 타격을 크게 받는 다면 다른 전방산업 쪽으로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다"며 “또 수출을 하기보다 최대한 생산한 국가 내부에서 물량을 다 소화할 수 있도록 공급 전략을 조정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정밀 부품 및 시스템 제조기업인 B사는 중국 대비 베트남 생산 기지가 가진 상대적인 경쟁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B사 관계자는 “이번 관세 조치는 대부분 중국산 제품을 겨냥한 것”이라며 “중국은 기존 20%에 더해 추가 34%의 관세율이 적용돼 총 관세율이 54%에 달한다”며 “반면 베트남은 이보다 낮은 46% 수준이므로 상대적 경쟁력은 아직 살아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미국 등으로 생산을 확대하긴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의류, 원단 제조업체인 C사는 베트남이 아닌 다른 국가를 생산 거점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C사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 관련 정책과 상황을 지켜보며 세부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며 “대처가 필요한 경우 우리 회사가 진출해 있는 제3 의 생산 국가에서 운영 중인 공장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hlim@sedaily.com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