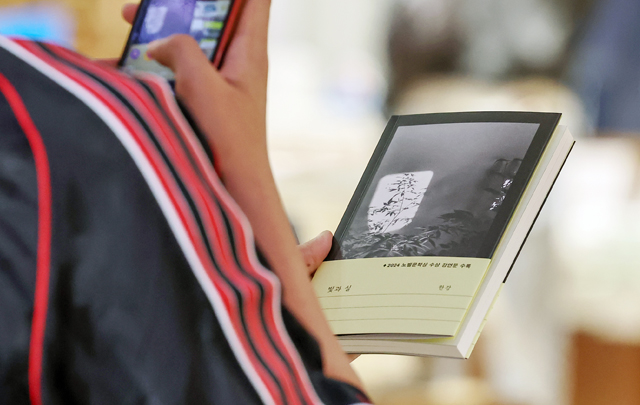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에 대한 대응책으로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 들면서 국내 산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국내 기업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수출 통제 움직임만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반도체·2차전지의 핵심 부품에 활용되는 17종의 희토류는 중국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이어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희토류 비축 상황과 공급망 불안 대응책을 논의했다. 중국 상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맞서 미국 수입품에 34%의 맞불 관세를 부과함과 동시에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입 통제도 시행한다고 밝히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중국이 수출 통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희토류는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늄 △스칸듐 △이트륨 등 7종이다. 사마륨과 디스프로슘은 전기차 모터의 핵심 부품인 영구자석의 재료로 쓰인다. 스칸듐은 알루미늄 합금 제조에, 이트륨은 고체 레이저 제조에 각각 활용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제 대상 중 디스프로슘과 이트륨은 6개월 치 이상 공공 비축 중”이라고 밝혔지만 미중 대결이 ‘강대강’으로 확전할 경우 국내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다.
전 세계 희토류 공급망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여전히 압도적이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 세계 희토류의 38%(4400만 톤)는 중국에 매장돼 있다. 중국의 희토류 생산량은 27만 톤으로 전 세계 69.2%를 차지한다. 중국은 17종의 희토류 모두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국 희토류 수입 물량의 대중 의존도 역시 여전히 높은 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의 희토류 화합물 수입액은 9790만 달러였는데 이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50.8%(4970만 달러)에 육박했다. 2020년(35.2%)과 비교하면 대중 의존도가 16%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중국이 수출통제를 가한 품목들의 지난해 수입액을 살펴봐도 이트륨 86.7%, 스칸듐 70.5% 등 대부분 중국산 비중이 가장 높았다.
전문가들은 당장 7개 품목의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은 수출 시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제재하는데 이번 조치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은 한중일 외교·통상장관회담에서 동아시아 국가 사이의 협력 확대를 강조하는 등 ‘한국·일본 끌어들이기’를 시도하고 있어 당장 우리나라와 무역 분쟁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실제 중국은 2023년 배터리 음극재 핵심 소재인 흑연에 대한 수출 허가제를 실시해 국내 2차전지 업계에 충격을 줬지만 이후 포스코퓨쳐엠·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업체에 흑연 수출을 승인해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 역시 “정확한 물량은 보안 문제로 공개할 수 없지만 수출통제 목록에 오른 품목은 상당량 비축돼 있다”며 “그럼에도 공급망 문제는 항상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 업체와 면밀히 소통하며 수요·공급 상황을 예의주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희토류 비축 목표 역시 기존 6개월분에서 18개월분으로 늘릴 계획이다.
문제는 미중 충돌이 장기화할 경우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매개로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이 통제 범위를 넓히지 않아도 국제 희토류 시장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박기순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는 “중국이 당장 희토류 수출을 막지는 않더라도 언제든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자체가 위협”이라며 “중국과의 관계 안정화에 신경 쓰는 한편 편중된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ojh@sedaily.com
joo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