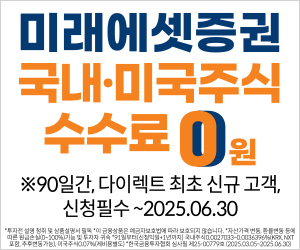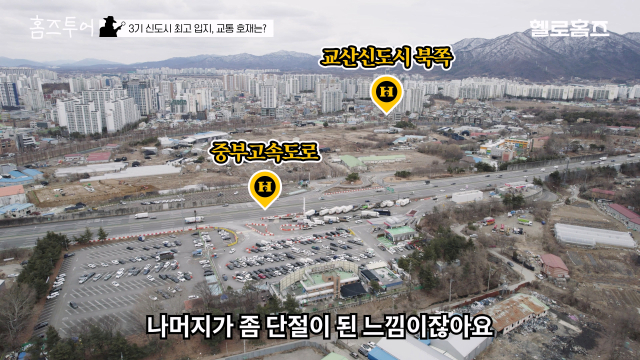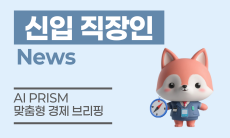최근 제주항공 무안참사와 서울 강동구 싱크홀 참사 등 각종 참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중대시민재해 예방·관리대상 목록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는 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중대시민재해 대상 현황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이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을 철저히 관리하고 ‘도로’를 포함하는 등 점진적으로 관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실련은 올 1~3월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환경부·소방청 등 4개 정부 부처와 245개 기초·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 대상과 재해발생 현황을 조사했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의 종류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발생한 ‘중대시민재해’를 규정하고 있다.
조사 결과 공공기관 130곳(52.2%)이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명부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중이용시설에는 시설물안전법상 1~3종 시설물이 포함되는데, 이 중 지자체·정부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응답한 시설물은 2만 5449개에 그쳤다. 국토안전관리원이 FMS(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중인 전체 1~3종 시설물 17만 8897개와 비교하면 실제 관리되는 시설물은 14.2%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통한 실효성 확대를 촉구했다. 김정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하나의 법에 담고 있다 보니 시민재해가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태원 참사·강동구 싱크홀 사고의 경우에도 사건이 발생한 ‘도로’가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을 통한 예방’이라는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기술직이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 중대시민재해를 담당하는 관행과 기초지자체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제대로 된 정책을 시행할 수 없는 점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총괄하는 부처가 없다는 점도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이유”라며 “재난·안전 총괄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법률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예방 활동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j@sedaily.com
m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