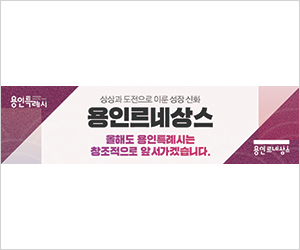금융감독원이 17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브이첨단소재·스맥 등 상장사 3곳이 추진 중인 유상증자를 막았다. 유상증자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필요한 설명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날 한국거래소는 중복 상장 문제를 우려하면서 SK엔무브 상장에 제동을 걸었다. 이를 지켜본 킵스파마 자회사 배터리솔루션즈, 코미코 자회사 미코세라믹스 등은 상장 계획을 철회했다.
당국 심사가 깐깐해진 것은 기업들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유상증자가 불투명하게 추진되는 건 둘째 치고 수시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주주 돈을 받아 자회사 채무를 변제하는 사례가 즐비하다. 주요국 대비 높은 중복 상장 비율도 대표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꼽힌다. 가뜩이나 국내 증시가 부진한데 주주가치 훼손 사례가 반복되다 보니 당국이 나서는 데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최근 미국 국채금리 급등과 환율 불안 등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진 환경에서 당국이 기업 목줄을 점점 더 세게 조이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도 자본시장에 관심을 갖고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불과 몇 년 만에 자금 조달 난이도가 급상승한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기 투자를 위해 주식자본시장(ECM)에서 정상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들마저 흔들리고 있다.
국내 증권사의 투자은행(IB) 업무 담당자는 “중복 상장과 유상증자가 번번이 가로막히면서 에쿼티 시장에서 기업 자금 조달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를 국내외 투자자에 주고 있다”며 “고금리 기조, 미국 관세 이슈 등 국내외 리스크가 만연한데 당국 기조가 자칫 시장 전반으로 악영향을 줄지 주시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기업들은 개인투자자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부채자본시장(DCM)으로 가고, 해외 증시 상장과 외화채 발행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기업 규모가 크지 않거나 부채 비율이 높아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기업들은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메자닌 발행에 나섰다. 1분기 메자닌 발행액은 1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 늘어나는 등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금감원이나 거래소의 유상증자와 중복 상장 허용 기준도 자세히 알 수 없다. 비슷한 시기에 대규모 자금 조달을 추진해 금감원 심사를 통과한 삼성SDI와 두 차례 정정 요구를 받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차이점은 대주주 승계 논란이 불거졌다는 것이다. 모회사가 상장돼 있는 롯데글로벌로지스는 SK엔무브와 달리 중복 상장 논란을 피해 상장 절차가 진행 중이다.
ECM에서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다양하지도 않다. 미국 기업들은 한국과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기업공개(IPO), 유상증자(SEO), 스팩(SPAC) 상장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소수 기관투자가에 비공개로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사모투자(PIPE)도 활발하다.
유상증자는 무조건 나쁘다는 인식도 벗어날 필요가 있다. 유상증자는 자본시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금 조달 방식이다. 성장을 위해 효율적으로 자금을 활용하면 기업가치가 상승하면서 주주에게도 이득이 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투자자와 소통하고 투명하게 자금 활용 계획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당국이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는 건 박수 칠 만한 일이지만 어느 정도 균형은 필요하다고 본다. 현금을 쌓아만 놓고 투자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다가 이제는 투자하겠다고 나서는 걸 주저앉히는 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다. 국내 한 증권사의 고위 관계자는 “자금 조달 여건이 어려운데 규제마저 들어와 기업들이 숨을 못 쉬는 것이 사실”이라며 “좋은 회사가 증자하면서 목표가 분명하고 수익성이 예상된다면 받아들여야 하는데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면 미래가 없다”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w@sedaily.com
j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