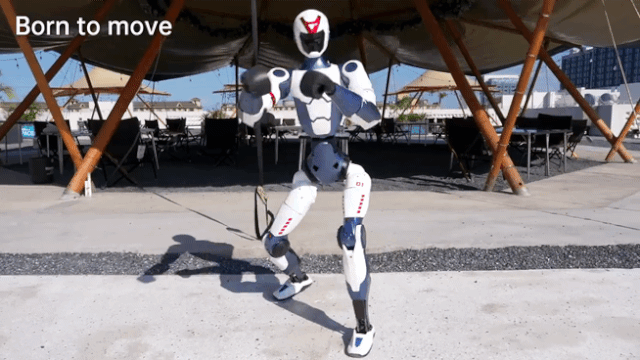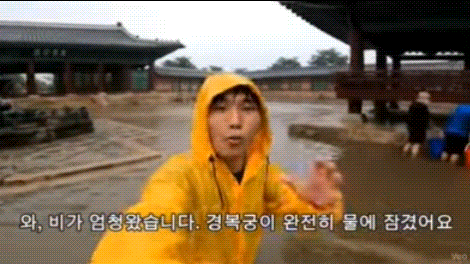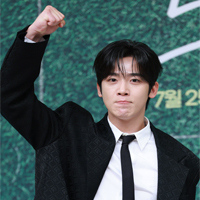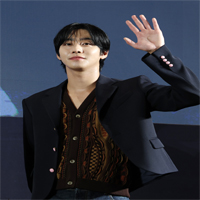거대 여당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밀어붙일 경우 이재명 정부가 내건 코스피 5000 공약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중 9곳이 제조업일 만큼 국내 증시의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데 파업이 일상화하면 14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자산 손실도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27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005930) 사내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조가 창사 이래 처음 파업을 선언한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삼성전자의 주가는 5.3% 하락했다. 외국인투자가들은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창구를 통해 이틀 동안 9200억 원이 넘는 매도 물량을 시장에 쏟아냈다. 시가총액은 24조 5000억 원이나 증발했다.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가 흔들리자 코스피 역시 이틀 동안 3.2%가 떨어졌다.
사업 특성상 노무 인력 의존도가 높은 CJ대한통운(000120) 역시 노조 리스크로 주가가 추락한 바 있다. 2021년 상반기 CJ대한통운은 코로나19 수혜주로 분류돼 시가총액이 4조 원을 넘었다. 하지만 2022년 노조가 본사를 불법점거하며 노사 갈등이 확산하자 당시 시가총액은 2조 5000억 원 수준으로 급락했다. 1년 만에 시가총액이 40% 넘게 증발한 것이다.
미국에서도 2023년 전미자동차노조(UAW) 파업 이후 일주일 동안 GM은 3.54%, 포드는 3.01%씩 주가가 하락했다. JP모건은 당시 파업으로 인해 GM이 1억 9100만 달러(약 2600억 원), 포드가 1억 4500만 달러(약 2000억 원)의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삼성전자나 미국 GM·포드의 사례는 노사 관계 불안정이 제조 기업의 주가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조법 개정안이 현행대로 처리되면 파업이 쉬워지고 공급망은 극도로 흔들리면서 관련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노조 리스크가 국내 증시의 레벨업을 막으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중대 요인으로 부상할 수 있는 셈이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국내 제조업은 경쟁국들에 비해 이미 노조 리스크가 큰 상황”이라며 “노조법이 개정되면 노조 대응이나 인건비, 공급망 관리 비용이 급증하며 기업가치가 큰 폭의 할인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oor@sedaily.com
do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