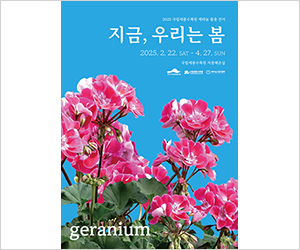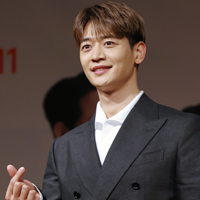여기에 신기술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키 위한 ‘기술사업화 개발 프로그램(R&BD)’을 도입하고, 5천억원 규모의 기술사업화 전문펀드도 조성키로 했다는 것이다.
한정된 R&D 예산으로 최대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술을 선택해 개발하고, 이것을 상용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기대가 된다.특히 기술혁신형 벤처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신 벤처 정책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기 적절한 정책 구상으로 여겨진다.
사실 정부가 기술사업화 정책을 펴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간 기술거래소를 설립해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에 나서기도 했고, 특허청을 중심으로 특허기술이 상품화될 수 있도록 자금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전개해 왔다. 하지만 공공연구 성과물이 민간으로 이전되는 비율이 15.3%에 그치고, 등록특허의 사업화 성공률이 11%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
산·학·연에서 개발된 기술이 대부분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그만큼 기존 정책 실효성이 낮았기 때문에 이번 정책에 기대를 걸어 본다. 우리는 이번 기술사업화 정책 구상에서 신기술 사업화 초기 단계에 집중 투자할 기술사업화 전문펀드에 주목한다.
그동안 기술 개발 과정 중 사업화 초기에 자본 투입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로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기술사업화에 걸림돌이 됐던 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이 정부가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해 신기술 사업화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다. 기술 개발과 달리 기술사업화는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1년 벤처 붐 기류를 타고 우수한 연구 결과물만으로 기업 설립에 나섰던 연구원들 가운데 다수가 실패의 쓰라린 경험을 겪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이번 정부의 구상은 기술 이전이나 사업화에 식견을 갖춘 유능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 박 훈 파퓰러사이언스 편집장 hpark@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