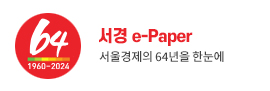“지구같은 행성” 단서 발견
지구에서 양(羊)자리 쪽으로 300광년 떨어진 별 주위의 먼지로 분석
지구에서 300광년 떨어진 별 주위에 형성된 유난히 짙은 먼지 고리가 지구와 같은 행성의 형성과정을 밝혀 줄 단서가 될 지 모른다는 연구 보고서가 한국인 송인석씨 등 과학자들에 의해 자연과학 전문지 `네이처에 실렸다.
BBC 인터넷 판 등에 따르면 미국 하와이 제미니 천문대의 송인석 선임연구원이 이끄는 연구진은 지구에서 양(羊)자리 쪽으로 300광년 떨어진 별 BD +20 307 주위의 먼지가 불과 1천년 미만 전에 두 개의 작은 행성이 충돌하면서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두 행성의 충돌이 아마도 원시 지구에 부딪힌 천체의 충격으로 달이 탄생한 것과 같은 과정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케크 망원경과 제미니 노스 망원경을 이용해 태양보다 약간 질량이 큰 이 별을 관찰한 송연구원은 “운이 좋았다. 이런 발견은 건초더미에서 바늘찾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발견한 먼지는 암석질의 소행성, 또는 행성 크기의 물체들이 부딪칠 때 예상되는 것인데 지구에서 태양처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별에서 이런 현상을 발견했다는 것은 그 의미를 더욱 높여주는 것이다.앞으로 천문학자들은 이런 종류의 충돌이 일어난 보통 별들을 더 많이 찾아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학자들은 BD +20 307처럼 지구-태양 거리에 있는 별에서 이처럼 강한 적외선 먼지 신호(별빛이 먼지에 의해 흡수되고 가열돼 재방출되는 현상)를 포착하기 위해 오랫동안 수십만개의 별을 관찰해 왔다.
BD +20 307를 둘러싼 먼지층의 존재는 지난 1983년 이 별에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적외선이 방출되는 것이 적외선천문위성에 의해 포착되면서부터 학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었다.
보고서의 공동 집필자인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학(UCLA)의 벤자민 주커맨 박사는 “BD +20 307 주변을 싸고 있는 높은 온도의 먼지 양은 유례없이 많은 것이어서 그것이 행성 크기의 물체간 충돌, 예를 들어 많은 과학자들이 지구의 달을 탄생시킨 것으로 믿고 있는 것과 같은 충돌의 결과라 해도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이 별의 나이가 약 3억년 정도이기 때문에 별 주위를 돌고 있을지 모르는 어떤 행성이라도 이미 형성돼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초기 태양계에서 목성이 그랬듯 행성을 형성하고 남은 바위들의 궤도는 항성계 내부의 행성들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축소기술부문
소형기기부문의 최신연구동향
디테일에 초점을
디테일을 중시하는 독자들이여, 기뻐하라. UC버클리의 연구진이 얇은 은박지를 이용해 적혈구 세포의 1/100만한 크기의 미세 특징을 잡아낼 해상도의 “슈퍼렌즈(superlens)’를 발명해냈다. 이 렌즈로 인해 향후 초감도 의료용 스캐너, 더 빠른 PC, 의회 도서관 소장 도서 전체 분량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DVD의 등장이 가능해지게 됐다.
유리 렌즈는 물체에 부딪혀 튕겨 나오는 광파(光波)를 잡아내 이를 구부림으로써 상(像)을 생성한다. 하지만 유리 렌즈의 경우 감쇠파(減衰波)를 포착해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감쇠파란 유리에 도달하기 전에 소멸되는 광선의 일종이다. 그 결과 오늘날 가장 우수한 렌즈조차 400나노미터 미만의 디테일에 대해서는 초점을 놓치기 마련이다.
UC버클리 연구팀은 은을 이용해 감쇠파를 포착, 확대할 방법을 찾아냈다. 감쇠파가 얇은 은박지에 닿을 때 감쇠파는 은박지 표면의 전자를 휘저음으로써 일종의 안테나를 생성하게 된다. 이 안테나는 광선을 강화해 일정 지점을 향해 광선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을 입증해 보이기 위해 연구진은 “나노(nano)”라는 낱말이 새겨진 크롬 판과 자외선 감광 고분자 코팅 사이에 은박지(슈퍼렌즈)를 한 장 끼워 넣었다. 그런 다음 크롬 판에 자외선을 조사(照射)하자 60나노미터 정도의 크기에 불과한 “나노”라는 낱말이 슈퍼렌즈를 통해 선명히 모습을 드러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다음과 같다. 바로 더 먼 거리에서 감쇠파를 포착해 확대하는 일이다. 이렇게 되면 질병 유무를 판별하기 위한 혈액 샘플의 스캔이나 고밀도 DVD의 식각(蝕刻 etching) 작업도 렌즈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