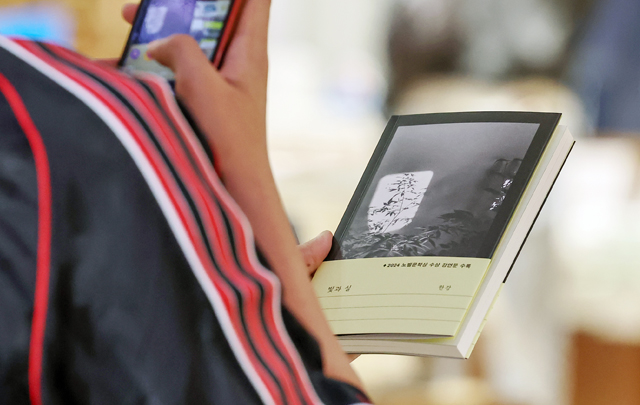당시 일본 경찰은 아오모리현 도호쿠 지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혈흔을 찾기 위해 베개에 시약을 뿌렸다. 그런데 베개 속에 들어있던 메밀껍질에서 AB형의 혈액반응이 나타났던 것. 물론 이 메밀껍질은 인간의 혈액이 전혀 묻어있지 않은 순수한 것이었다.
이 놀라운 결과가 뉴스에 보도되며 식물에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혈액이 있다는 소문이 퍼져나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메밀껍질이 AB형 혈액과 동일한 형태로 시약에 반응한 것일 뿐 메밀에 AB형 혈액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은 아니다.
인간의 혈액형은 특정 혈액형의 항응집소(凝集素)를 넣었을 때 그 혈액이 반응해 응고가 진행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항 A응집소에 응고되면 A형, 항 B응집소에 응고되면 B형인 것.
두 응집소에 모두 응집한다면 혈액형은 AB형이 된다. O형의 경우 O형인 사람의 피를 닭과 같은 동물에 주사해 거기서 생기는 항 O응집소를 사용해 판별한다.
그런데 위의 사례에서처럼 항응집소는 오직 혈액에만 응집반응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식물의 즙에도 반응을 보인다. 일례로 식나무와 사르레 피나무의 즙은 항 A형 응집소에, 줄사철나무와 꽝꽝나무는 항 B형 응집소에 반응을 일으킨다.
그리고 메밀·자두나무·아왜나무·가막살나무는 항 AB형 응집소, 동백나무·포도·무는 항 O형 응집소를 넣으면 응고가 시작된다.
하지만 이는 그 식물에 우연히 인간의 혈액 속에서 응고를 일으키는 물질인 당 단백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